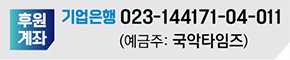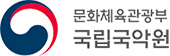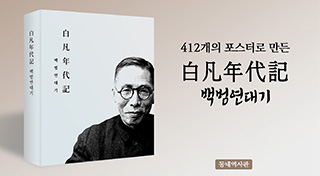만파식적(萬波息笛) ; 음악으로 완성한 삼국통일
대왕암(大王岩)과 감은사(感恩寺)
만파식적(萬波息笛) 이야기를 쫓아 경주 문무대왕릉을 찾았다. 대왕암(大王岩) 앞에는 무속인들이 이곳저곳에서 진을 치고 굿을 하고 있었다. 용왕신을 모시는 무속인이 아닐지 생각되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문무대왕릉의 이야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만파식적편에는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신라 30대 문무대왕은 “내가 죽은 뒤 바다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자 하니 화장하여 동해에 장사 지내라”라고 유언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이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아들 신문왕이 바다의 큰 바위 위에 장사를 지내고 그 바위를 대왕암(大王岩)이라 불렀다.

대왕암 주변의 무속인과 남겨진 음식을 먹기 위해 날아든 갈매기 떼
문무대왕은 21년의 재위기간 동안 백제부흥군(百濟復興軍)을 진압하였고 당(唐)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며 이후 당군(唐軍)을 몰아내고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신라 30대 왕이다. 이 대왕암 가까이 감은사(感恩寺)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은 문무대왕이 불법을 빌어 왜병을 막고자 짓기 시작하였는데 그의 아들 신문왕이 즉위한 2년 뒤에야 완공되었다 한다. 신문왕은 이러한 아버지의 뜻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름을 감은사(感恩寺)라 하였다.

감은사지 3층석탑
일연이 삼국유사를 쓸 당시 감은사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금당 돌계단 아래에 동쪽을 향해 구멍을 하나 뚫어 용이 된 문무대왕이 절로 들어와 돌아다니게 하였다고 한다. 절터 아래에는 논이 있는데 아마도 그 시절에는 이 앞까지 물이 흘렀을 것으로 보인다. 절터에는 거대한 3층 석탑 두 개가 우뚝 솟아 있는데 기대 이상으로 장엄하고 거대한 규모를 하고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피뢰침처럼 솟아 나와 있는 찰주(刹柱)라 불리는 철침이 부식되어 사라지지 않고 1,300년이나 버티고 있었다.
탑(塔)이란 단어는 본래 인도 말 스투파가 중국에서 탑파(塔婆)로 음차 되었다가 탑으로 축약된 것이라 한다. 스투파는 인도 전통의 화장문화에서 유골을 모시는 무덤으로 붓다의 사리를 수습하면서부터 불교로 수용되었다. 붓다는 원래 죽은 뒤 자신의 모습을 우상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였으나 그가 열반(涅槃)에 이른 뒤 600년이 지난 뒤부터 포교를 위해 다양한 불상이 생기게 되었다 한다. 그러니까 탑은 불상이 생기기 전까지는 부처의 유일한 상징물로서 숭배된 것이다. 석탑 안에는 부처님의 사리가 사리장엄구에 담겨 있다. 이 두 석탑에서 나온 사리장엄구 중 하나는 국립경주박물관에 또 다른 하나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되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담고 있는 감은사와 대왕암은 네비게이션상으로 1.8km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그런데 이 두 유적지에서는 그 이야기를 덩그러니 세워진 팻말의 글로만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잘 가꾸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컸다. 대왕암 주변이 조금 더 왕릉의 위엄을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조성되면 좋지 않을까 싶다. 그 곳을 찾는 무속인들도 번듯한 공간에서 무악 행위를 하게 하고, 그곳을 찾는 시민들이 그 모습을 종교를 떠나 예술 행위로 관람하게 해 주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감은사도 절터만 있을게 아니라 곁에 그 내력을 설명들을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박물관이라도 있어서 원래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요즘 유행하는 3D 증강현실, VR 유적탐방 등으로 확인 할 수 있게 하여 가족 단위로 아이들 교육을 위해 찾아 오는 곳이 되면 좋지 않을까. 석탑에서 나온 사리함의 모조품이라도 볼 수 있고 3D프린터로 석탑이나 사리장엄구를 복제한 기념품이 있으면 집에 두고 보며 이 장소를 기억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만파식적(萬波息笛)
《삼국유사》에 나오는 만파식적(萬波息笛)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다. 신문왕 2년(682년)에 바다를 지켜보는 관리가 동해안에 작은 산이 감은사 쪽으로 온다고 보고한다. 천문을 보는 관리는 바다의 용이 된 문무왕과 천신이 된 김유신 장군이 성(城)을 지키는 보물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 바닷가로 나가보라고 한다.
이견대(利見臺)에 가서 왕이 신하에게 제사를 지내는 동안 섬을 지켜보라 하니, 섬의 산세는 거북 머리 같고 그 위에 대나무가 있었는데, 낮에는 둘로 나뉘고 밤에는 하나로 합쳐지더라 고(告)한다. 이튿날 대나무가 하나로 합쳐지더니 천지가 진동하고 비바람이 일기를 7일 동안이나 지속되고 나서 바다가 평온해졌다. 왕이 배를 타고 그 섬에 들어가니, 용이 흑옥대(黑玉帶)를 왕께 바치었다. 왕이 어찌하여 산과 대나무가 둘로 갈라졌다 합쳐졌다 반복하는지 용에게 물어보니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이치처럼 대나무를 합쳐야 소리가 난다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이견정(利見亭)과 그 곳에서 바라본 대왕암
왕은 오색비단, 금옥과 치성으로 용에게 보답하고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월성(月城) 천존고(天尊庫)에 보관하였다. 그 피리를 불면 적군이 물러나고, 병이 나았으며, 가물면 비가 오고, 장마가 지면 날이 개었으며,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졌다. 그래서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고 부르고 국보로 삼았다 한다.
신문왕이 극복했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만파식적의 설화는 신문왕이 처한 난관(難關)을 극복하는 과정을 상징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학자는 이 설화를 신문왕의 장인(丈人) 김흠돌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한 일과 관련지어 신성한 왕권을 상징하고자 했던 데에서 생긴 이야기라 말하기도 하고, 당시 강했던 귀족들의 권력을 축소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한 이념으로서 유교(儒敎)와 이를 진흥하고자 설치한 국학(國學), 예악사상(禮樂思想) 등과 관련지어 그 의미를 찾기도 한다.
이에 대해 조금 다른 생각을 해 보았다.
삼국통일을 이룩한 문무왕의 뒤를 이은 신문왕에게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었을까? 물론, 반란도 문제이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귀족들도 문제였겠지만, 무엇보다도 백제부흥운동에서 보여주었듯이 백성들이 통일된 신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지 못한 것이지 않았을까?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하고도 바다 위의 섬을 무덤 삼아 해룡(海龍)이 되고자 하였던 이유도 백제부흥군에서 확인한 왜의 존재 때문이었을 것이다.
신라 땅 곳곳에 숨어 백제의 부흥을 꿈꾸는 세력과 일본 땅으로 건너간 백제의 귀족들이 왜인들과 힘을 합쳐 호시탐탐 재기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이었기 때문에 부처의 힘을 빌려서라도 막아 보고자 감은사를 짓고, 바다 한가운데 대왕암을 무덤으로까지 삼은 것이 아닐까?
신문왕에게는 삼국의 국토 통일 이후 백제 유민들을 신라의 백성으로 포섭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 중 하나였을 것이다. 물론, 고구려 유민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겠지만 신라가 이룩한 삼국통일은 사실 고구려 땅은 연합군인 당(唐)이 차지하였고 그들이 설치한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의 통제를 받는 상황이었다. 신라에 투항한 고구려 유민에게 세워 준 보덕국(報德國)의 왕 안승(安勝)은 쉽게 포섭되기도 하였고, 고구려부흥운동이 일어나도 북쪽의 당을 향하는 것이 이치일 테니, 골치거리인 왜와의 연관성을 생각했을때 백제만큼 그 위협은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 보았다.
만파식적(萬波息笛) : 백제 유민을 신라 백성으로
이쯤에서 필자는 만파식적(萬波息笛)을 백제 악기이거나 이로 연주한 음악이라는 상상을 해 보았다. 신문왕은 용이 된 문무왕이 주신 신령한 대나무로 만든 악기라며 백제 유민에게 그들의 악기를 들어 보이고 그들을 위해 백제의 음악을 연주하여 위로한다.
왕이 직접 이들을 신라인으로 받아들이겠다며 그들의 음악까지 연주하며 극진히 대접했다면 백제 유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전쟁의 난리통에 나라는 망하고 피난민이 되어 갖은 고초를 겪으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적국 신라왕이 묵을 수 있는 잠자리와 먹을 음식뿐 아니라 고향의 음악을 연주하며 잔치를 베풀었다면 그때의 그 감동은 어떠했을까.
만만파파식적(萬萬波波息笛) : 백제, 고구려 유민이 신라 백성이 되어야 삼국통일
《삼국유사》 백률사(柏栗寺)편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신문왕의 뒤를 이은 효소왕(692년)은 부례랑을 국선(國仙 : 화랑중 총지도자)으로 삼았는데 이듬해 3월, 부례랑과 그의 부하 안상이 말갈족 군사들에게 납치를 당한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효소왕은 군사들을 풀어 샅샅이 뒤졌으나 찾을 수가 없어 선왕이 물려준 만파식적과 거문고로 영험한 능력을 빌어 보려 하였으나 이 두 영물도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는다.

경주에 지어진 천존고(天尊庫) : 만파식적 이야기는 아쉽게도 건물에서 찾지 못했다.

백률사(柏栗寺) : 절이라기보다는 암자에 가까웠다.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 탓일 듯하다.
한편, 부례랑이 없어진 뒤 그의 부모는 매일 같이 백률사로 가서 불공을 드렸는데, 어느 날 불당 안에 사라진 거문고와 만파식적이 놓여 있고, 부례랑과 안상이 불상 뒤에서 불쑥 나와서는 그간의 사연을 이렇게 말해 주었다. 말갈족에 잡혀간 부례랑 앞에 어느 날 홀연히 스님 한 분이 나타나더니 바닷가에 있는 안상과 만나게 해 주었고 들고 온 거문고와 만파식적을 타라고 하여 올라탔더니 공중으로 떠올라 어느덧 이 절에 오게 되었더란다. 이 일은 급히 효소왕에게 보고 되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부례랑을 구해준 스님은 바로 백률사 법당 안에 있던 불상이었다고 한다.
효소왕은 부례랑의 이야기를 다 듣고 밭 1만 경을 비롯하여 갖가지 재물을 백률사에 바쳐서 부처님의 은덕에 보답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길한 징조인 혜성이 나타났다. 왕이 이상히 여겨 점을 치는 관리에게 묻자 가야금과 만파식적에게 상으로 벼슬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만만파파식적(萬萬波波息笛)'이라는 칭호를 내리자 이내 혜성이 사라졌다.
이 이야기도 음악으로 유민들을 위로한 사건으로 해석해 보았다. 말갈족은 고구려 유민이다. 신라의 국선 부례랑과 안상이 말갈족에 납치당했다는 것은 고구려 유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효소왕은 어떻게 극복한 것일까? 혹시, 아버지 신문왕이 백제 유민을 음악으로 위로하여 포섭했던 만파식적의 지혜를 떠올린 것은 아니었을까?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이 유민이 아니라 신라인이 되어야 진정한 삼국통일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효소왕은 소동을 일으킨 고구려 유민뿐만 아니라 백제 유민까지 불러 그들의 악기인 거문고와 만파식적으로 그들의 음악을 연주하고 잔치를 베풀어 이들을 신라인으로 품는 감동적인 상황을 연출했을 것이라는 상상을 덧보태 본다.
백제는 관악기, 고구려는 거문고, 신라는 가야금
만파식적이 백제의 악기일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를 알아보았다.
첫 번째로 삼국시대의 악기 중 관악기에 대한 기록이다. 이와 관련한 기록으로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삼국유사》의 만파식적, 경덕왕 19년(760년)에 도솔가를 지어 읊었다던 월명스님의 적(笛) 그리고 《삼국사기》 악지에 신라의 음악으로 소개한 삼죽(대금, 중금, 소금)이 있다. 그런데, 이 신라의 삼죽이 통일신라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기록이 없다.

이 사료만으로는 만파식적을 백제악기로 특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일본후기(日本後紀)》에는 이런 해석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다. 기록에 따르면 삼국에서 왜로 건너 온 악사가 고려악사는 4명으로 횡적(橫笛 : 가로로 부는 관악기), 공후(箜篌), 막목(莫目 : 세로로 부는 관악기), 무등사(舞等師 : 무용가)이고, 백제악사도 4명으로 횡적(橫笛), 공후(箜篌), 막목(莫目), 무등사(舞等師)로 같다. 그런데, 신라악사는 금(琴), 무등사(舞等師) 두 명만 기록되어 있다. 즉, 신라에서 왜로 전해준 궁중음악은 가야금과 무용만 있고 관악기는 없는 것이다.
신라의 토우 중에서는 관악기를 부는 모습의 토우가 출토되기도 하였기에 신라에 관악기가 아예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통일신라 이전에는 관악기 연주가 궁중음악까지는 발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추론하면, 만파식적은 고구려나 백제의 악기일 가능성이 커진다.
두 번째로 삼국시대의 기후에 대해 알아보았다. 관악기의 재료인 대나무는 비교적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란다. 삼국시대의 기후가 지금보다 따뜻했다면 북쪽 지방인 고구려에서도 대나무를 쉽게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연구 논문에 사용되는 온도 그래프 중 Singer&Avery, ‘Unstoppable Global Warming’(2006) 게재된 그래프와 Cliff Harris & Randy Mann ‘Global Temperature Trends from 2500 B.C. To 2040 A.D.’(2017)에 게재된 그래프 두 개를 편집하여 얻은 아래의 기후변화와 왕조교체 그래프를 보면 삼국시대의 기후는 오히려 지금보다 춥다. 결국 삼국시대의 대나무가 자랄 수 있는 북방한계선은 현재의 북방한계선보다도 더 남쪽일 거란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고구려 지역에서는 화살류를 만들 정도의 얇은 굵기의 대나무는 얻을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관악기를 만들 정도의 굵은 대나무를 얻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 시절 관악기를 만들 수 있는 굵기의 대나무는 남쪽인 백제나 신라에서 자랐고 그들이 만들어 연주했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후기(日本後紀)》를 근거로 보았을때는 궁중악기로 쓰인 관악기는 백제의 악기로 특정하는게 합리적인 추론이 된다.
이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만파식적을 백제의 악기로 추정해 보았다. 삼국을 대표하는 악기는 고구려 거문고, 신라 가야금, 백제는 관악기라고 상상을 갈무리한다.

기후변화와 왕조교체(출처 : 지구 위에서 본 우리 역사)
최은서(한성여중 교사, 국악박사)
<참고자료>
김성혜, 삼국시대 음악사 연구, 민속원, 2009
김성혜, 신라토우 속의 음악과 춤, 민속원, 2017
이혜구, 國樂史<上古에서 麗末까지>, 『韓國藝術總覽 槪觀篇』, 大韓民國 藝術院, 1964
자현스님, 사찰의 상징세계(上), 불광출판사, 2021
이진아, 지구 위에서 본 우리 역사, 루아크, 2017
공우석, 「대나무의 시·공간적 분포역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제39권 4호, 2001, 444~457쪽
김상현, 「萬波息笛說話의 形成과 意義」. 『한국사연구』 34권, 1981, 1~27쪽
윤철중, 「만파식적설화연구(1)」, 『大東文化硏究』 26권. 1991, 17~34쪽
원혜영, 「감은사 입지에 대한 지리적 고찰」, 『초등교육연구논총』 제38권 3호, 2021, 23~42쪽
신라문화원 TV - 오늘 떠나볼 경주의 문화유산은?! 감은사지!
(https://www.youtube.com/watch?v=Oa3qh-Zr8_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