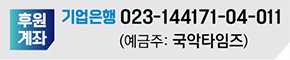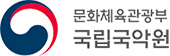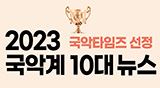토속의 슈퍼 영웅 처용(處容), 세계가 경탄한 수제천(壽齊天)에 춤추다.
‘처용(處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탈이다. 탈들은 대개 각자마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처용만큼 특별한 것도 없을 것이다. 처용은 처용설화를 바탕으로 탄생한 탈이다. 처용설화는 신라 49대 헌강왕(憲康王 : 재위 875~886년) 시절 실화를 바탕으로 탄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 그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통일신라시대에는 팔구체 향가인 처용가(處容歌), 고려시대에는 고려가요(高麗歌謠) 처용가로 노래가 되어 불렸고, 조선시대에는 처용무(處容舞)라는 가무악(歌舞樂)이 조화로운 예술작품으로 탄생되어 무려 1,1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처용무는 궁중정재(宮中呈才 : 궁중무용) 중 유일하게 탈을 쓰고 추는 춤인데, 그 예술적 아름다움이 높게 평가돼 1971년부터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오늘은 이 처용을 찾아 떠나겠다.

악학궤범의 처용가면
조선 성종 때 편찬된 《악학궤범(樂學軌範) : 궁중음악의 연주에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망라한 책)》에는 처용무에 쓰인 처용의 가면이 그려져 있다. 넓은 이마, 무성한 눈썹, 우그러진 귀, 우묵한 코, 밀어나온 턱, 숙어진 어깨 등으로 묘사된 모습이 우리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서남아시아의 아랍권 사내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이 얼굴을 대문에 새기면 역신(疫神 : 천연두를 퍼트리는 귀신)과 요사한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이 전해 내려온다.
귀신을 쫓는 의미를 담고 있는 캐릭터인 만큼 귀신이 싫어한다는 붉은색의 얼굴을 하고 있다.
섣달그믐날 동지팥죽을 쑤어 먹고 대문밖에 뿌리는 이유와 같다. 머리에 쓰는 관료들의 모자인 검은색 사모(紗帽)에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복숭아 나뭇가지에 열매 7개가 장식되어 있고 부귀와 출세를 뜻하는 모란꽃 2송이도 양옆에 꽂아 놓아 벽사진경(辟邪進慶 : 악귀를 물리치고 좋은 기운을 맞이한다는 사자성어)의 뜻을 담았다.
처용무는 음력 섣달그믐날 밤에 잡귀를 쫓기 위해 하던 의식인 나례(儺禮)에서 추어졌던 춤으로,고려말까지 한 명이 추는 춤이었으나 세종 때부터 다섯 명이 오방색(五方色)의 옷을 입고 춤을 추었다. 이때부터 오방처용무(五方處容舞)라고도 불리었다.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다섯 개의 방위를 색으로 표현하곤 한다. 황제가 있는 중앙은 황색(黃色), 푸른 바다가 있는 동쪽은 청색(靑色), 덥고 뜨거운 남쪽은 붉은 적색(赤色), 백사장(白沙場)처럼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는 서쪽은 백색(白色), 겨울에 어두운 밤만 지속되는 북쪽은 흑색(黑色)이다.
세계가 경탄한 천상의 음악 수제천(壽齊天)
처용무의 처음 연주 음악은 수제천(壽齊天)이다. 수제천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향악(鄕樂 : 우리 고유의 음악) 중 가장 오래된 아악곡(雅樂曲 : 궁중 고전음악)이다. 백제가요인 '정읍사(井邑詞 : 한글로 기록된 가장 오래전 가요)'의 반주로 쓰였으나 지금은 독립적인 기악곡으로 연주되고 있다.
이 수제천은 1970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회 유네스코 아시아 음악제에서 전통음악 분야 최고 그랑프리를 차지했는데, 당시 심사위원들은 ‘천상의 소리’라며 극찬했다고 한다. 수제천을 우리 전통 오케스트라라고 할 수 있는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듣는 것도 아름다움에 취하게 되지만, 처용무와 함께 감상하는 것은 또 다른 묘미가 있다. 왜 왕들이 음악을 귀뿐만 아니라 눈으로 함께 즐겼는지 그 이유를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감흥에는 많이 못 미치겠지만 영상자료를 찾아서라도 잠시 감상해 보기를 권한다.


처용무 감상하기(https://www.youtube.com/watch?v=Of7IFL8JhHA)
처용무는 춤과 음악 그리고 노래까지 악가무(樂歌舞)가 함께 어우러진 작품이다. 처용의 등장음악인 수제천 연주가 끝나면 다섯 명의 무용수들이 일렬로 서서 고려가요 처용가의 첫수인 신라성대소성대(新羅盛代昭聖代)라는 가사를 가곡(歌曲 : 우리 전통 성악인 정가 중 하나) 중 언락(言樂)이라는 서정적인 가락에 맞추어 부른다. 이어서 관악영산회상(管樂靈山會上) 중 향당교주(鄕唐交奏, 상영산을 10박으로 변주), 세영산(細靈山), 삼현환입(三絃換入, 삼현도드리)을 연주한다. 이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대형을 갖추며 춤을 이어간다.
무용수들이 다시 한 줄로 서서 ‘산하천리국(山下千里國)’ 가사를 가곡(歌曲) 우편(羽編) 가락에 맞추어 부른다. 노래가 끝나고 세환입(細還入, 웃도드리)을 연주하면 무용수들은 퇴장하고 공연이 종료된다. 집박(執拍 : 박을 폈다 접으며 소리를 내는 지휘자)의 박(拍) 연주 소리를 찾아 음악의 변화를 느껴보는 것도 재미를 줄 것이다.
이와 같은 공연 순서는 고종황제의 궁중 악사들이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뒤 활동하던 이왕직아악부의 연주 절차를 따른 것인데 최근의 공연에서는 전반부에 부르던 가곡의 언락이 생략되고 있어서 아쉬움이 크다. 처용무는 나례(儺禮) 이외에 궁중연향(宮中宴享 : 궁중잔치)에서도 연행(演行)되었는데 부정한 기운을 정리하는 의미로 맨 마지막 대미(大尾)를 담당하였다.
개운포(開雲浦)에 나타난 처용(處容)
巡幸國東州郡 : 왕이 나라의 동쪽 주군을 순행하였는데
有不知所從來四人 :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네 사람이
詣駕前歌歌舞 : 왕의 수레 앞에 와서 노래와 춤을 추었다.
形容可駭 : 그들의 생김새가 해괴하고
衣巾詭異, 옷과 두건이 괴이하였다.
時人謂之 : 당시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山海精靈. 산과 바다의 정령이라 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권11 49대 헌강왕편
처용의 이야기는 우선 《삼국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신라 49대 헌강왕(879) 5년 3월에 괴이한 사람이 왕의 수레 앞에서 춤과 노래를 선보인 내용이 나온다. 생김새와 옷, 두건이 괴이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신라인이 아닌 타국 사람으로 유추해야 할 것이다.
《삼국유사》 제2권 처용랑망해사(處容郞望海寺) 편의 이야기는 좀 더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다. 왕이 개운포(開雲浦)에 와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가려 앞을 볼 수 없었다. 천문 관측과 점성을 담당하던 신하가 “동해에 사는 용이 일으킨 조화이니 좋게 달래어야 한다.”라고 고(告)한다. 그 말을 듣고 왕은 근처에 좋은 땅을 골라 용을 위하여 절을 짓도록 명하자 바로 어두운 구름이 걷히었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그때부터 이곳을 개운포(開雲浦 : 구름이 걷힌 포구)라고 불렀다고 한다. 헌강왕은 용을 위해 망해사(望海寺)라는 절을 세웠는데 현재는 울주군청 뒤에 절터와 승탑만 남아 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구름이 걷히고 동해의 용은 일곱 아들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동해의 용은 자신을 위해 절을 짓게 한 왕의 뜻에 감사하며 음악과 춤을 연주하였으니 그 일곱 아들 중 하나가 처용이다. 처용은 왕을 따라 도성으로 가서 왕의 정사를 돕고 관직도 받았다고 한다.

울산 공단 속 개운포(開雲浦) 처용암(處容巖)
이런 멋진 설화가 스며 있어 설레임을 안고 찾은 개운포 처용암은 기대와는 다르게 울산의 공업단지 도로 옆 황량한 공간에 버려진 듯했다. 거대한 규모의 공업지대가 설화를 담은 처용암을 압도하고 있었다. 다만, 처용의 설화가 있는 곳임을 알리는 비석과 만화 캐릭터로 만들어져 우스꽝스레 서 있는 춤추는 처용의 모습이 그 옛 이야기를 담은 장소임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과 멀리서 발품을 팔며 어렵게 찾아온 수고로움에 피로함까지 더해지니 아쉬움은 더욱 커졌다.
천연두 귀신을 막아내는 토속 슈퍼 영웅이 탄생하다!
《삼국유사》에 처용가(處容歌)라는 8구체 향가가 수록되어 있다. 학창 시절을 더듬어 보면 어렴풋하게 생각날 만도 하다.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대략 이렇다. 헌강왕은 서라벌로 함께 온 처용에게 아름다운 부인과 벼슬을 내린다. 여느 날처럼 신나게 춤추며 놀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처용은 황망한 장면을 목격한다. 역신(疫神)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고 있는 장면을 본 것이다.
그러나, 처용은 그걸 보고도 ‘어허~ 이불 밖에 나온 다리가 넷인데 두 개는 내 부인 것이 맞고, 다른 두 개는 누구 것인가.’라며 태연하게 노래를 지어 부르고 춤까지 추었다 한다. 이에 탄복한 역신은 처용에게 부인을 탐한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앞으로는 대문에 당신의 얼굴을 그린 그림만 붙여 두어도 그 집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 후부터 백성들은 처용의 형상을 그려 문간에 붙여 역신(疫神)과 귀신을 물리쳤다고 전한다.
우린 보통 무서운 것을 말할 때 ‘호환(虎患) 마마보다 무섭다’라고 표현한다. 달리 말하면, 옛날 우리 조상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호랑이에게 물려 죽거나 마마 즉 천연두에 걸리는 것이었단 얘기이다. 천연두는 기원전 1,000년 전부터 1900년대가 넘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3,000년 동안 우리 조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를 괴롭혔던 전염병이다.
이 역병이 돌면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병들어 죽었다. 마땅한 치료법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가족 친지들이 죽어 나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또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공포 속에 떨어야만 했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이와 같은 공포를 느껴보아서 그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무려 3,000년 동안이나 주기적으로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무지막지하고 무서운 역병을 극복해 낼 수 있다는 믿음을 준 존재가 우리에게 생겨난 것이다. 그 슈퍼 영웅이 바로 처용이다.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무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초월적인 존재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블 영화에나 나올법한 슈퍼 영웅이 탄생한 것이다. 과학적으로는 통일신라 시대의 처용이 역병을 물리쳤을 리 없지만, 그 시대를 살던 집단의 염원은 처용을 무지막지한 전염병인 천연두를 물리치는 초월적 능력을 지닌 존재로 탄생시킨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나라에서는 백성이 가지고 있는 역병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하늘에 제사를 지내왔다. 이런 기원을 담은 행사는 지금 현대문명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의미를 지녔을 것이다. 과학 문명이 발달 한 현시대에도 미지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무언가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거에는 오죽이나 컸겠는가. 왕의 통치력과 위엄만큼이나 성대하고 아름답게 연출된 춤, 노래, 극 등 종합예술 행위가 그 시절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소망과 만났을 것이다. 그러한 집단의 염원이 구현되는 장소에서 처용은 구나의식(驅儺儀式 : 역귀를 쫓는 의식)의 상징이자 노래이고 춤이 된 것이다.
연산군의 풍두무(豐頭舞)
처용무 하면 연산군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천연두라는 무시무시한 역병을 막아내는 슈퍼 영웅을 연산군은 너무도 사랑했던 것 같다. 직접 탈을 쓰고 춤을 추는데 얼마나 잘 추었는지 곁에서 구경하던 궁녀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을 정도였다고 하니 말이다.
세종 때부터 연산군까지 일곱 왕을 섬긴 조선 최고의 내관(內官) 김처선(金處善)이 충언을 올리자, 진노한 연산군이 그를 죽이고 그의 이름이 들어간 한자를 쓰지 못하게 하자 처용 가면이 한자 풍(豊)자랑 닮은 점을 따서 처용무는 잠시 풍두무(豐頭舞)로 불리기도 한다.
폭군 연산군을 반정(反正)으로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중종 역시도 처용무를 즐겼는데 신하들이 춤추기를 말렸다고 전한다. 아마도 처용 탈을 쓰고 광기를 부리던 연산군을 떠올리며 말리지 않았을까 생각되니 신하들의 마음이 일간 이해도 되었다.
과학 교사의 상상 플러스
처용설화는 처용의 부인이 천연두 귀신과 동침했을 리 없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처용은 용신을 모시는 무당이었고 아내에게 역신이 들자, 그 귀신을 쫓기 위해 지은 노래가 처용가라는 이야기부터, 처용의 부인이 천연두에 걸리자, 페르시아의 의사였던 처용이 치료한 것이라는 등등 재미있는 해석이 있다. 하지만, 천연두 치료는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야 가능했다. 신라시대 처용이 백신으로 치료했을 리 없지 않은가. 처용설화를 이렇게 해석 해 보면 어떨지 필자는 이 지면을 빌어 상상력을 보태보기로 한다.
처용은 늦은 밤까지 술에 취해 춤추며 놀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가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다. 그렇지만, 기분 좋게 취기가 올라 있던 처용은 그 화가 나는 순간을 춤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위트있게 향가를 창작해 부르며 자신의 불쾌한 마음을 상간남에게 전한다.
이에 놀란 상간(相姦)남은 처용에게 다시는 집 근처에 얼씬대지도 않겠다는 약속한다. 처용은 아름다운 부인을 너무도 사랑했기에 사과를 받고 둘을 용서하고 상간남을 보내준다.
한편, 이 상간남이 사는 곳은 천연두라는 역병이 돌아 마을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한 동네이고 이 상간남 또한 처용의 집에서 나온 뒤 얼마지 않아 역병으로 죽는다. 처용이 사는 마을 사람들은 그 역병이 처용의 부인에게 전염되어서 온 마을로 퍼지지나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한다. 그러나, 처용의 부인은 어려서 천연두를 가볍게 앓아 이미 몸에 항체가 있어 병이 옮지는 않는다. 그런 지식이 없는 당시의 사람들은 붉은 팥죽색 피부를 한 이방인 사내가 신통력을 발휘해서 역병을 쫓아냈다고 믿게 되었다.
처용(處容)은 아랍인일까?
본 칼럼은 처용을 아랍계 사내로 보고 글을 전개하였는데, 그렇게 본 이유는 무엇보다 가면의 모습이 너무도 아랍인을 닮아있다는 점이다. 아니 닮았다기보다 아랍인 모습의 탈이라 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을 합쳐 본다면 처용은 용의 아들 즉, 바다로부터 온 것이고 괴이한 생김과 의복, 두건을 하고 있음은 이민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의 고대문명이 아랍권과의 해상을 통해 교류했음은 김수로왕의 부인인 허황옥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필자는 발걸음을 김해에 있는 김수로왕릉과 왕비릉으로 향했다. 허황옥은 《삼국유사》 가락국기에서만 등장하는 인물로 고향은 인도 아유타라고 기록돼 있다. '허황후', '허왕후'라고도 불리며 한국의 성씨 중 하나인 김해허씨의 시조이다. 허황옥이 인도에서 온 증거로는 파사석탑(婆娑石塔)이 있다. 돌에 희미한 붉은 보랏빛 무늬가 보이는데, 분석 결과 한반도에 없는 돌로 밝혀졌다 한다.

허황옥이 가져온 파사석탑
석탑의 이름 ‘파사’는 우리말에서는 그 뜻을 찾기 어렵다. 그런데 그 뜻을 고대 인도 지역의 타밀어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Paasa'는 부모나 스승, 성직자 등의 사랑을 뜻한다고 한다. 타밀 사회에선 자녀들이 멀리 곁을 떠날 때 부모나 성직자들이 자녀들의 평안과 신의 가호를 빌고 악을 물리치기 위해 몸에 지니는 부적을 주었는데 이를 “Paasadol”이라고 했다고 하니 연관성이 놀랍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허황옥이 계절풍을 뚫고 항해하기 위해서는 배가 무거워야 했기 때문에, 첫 항해 실패 이후 무게를 맞추기 위해 싣고 온 돌이라는 해석도 있다. 함께 온 선원들이 돌아갈 때는 김수로왕에게 받은 결혼 선물과 곡물들로 무게가 맞추어 돌아갔을 것으로도 추측하고 있다. 김수로왕릉의 쌍어 문양도 인도의 도시에서 현재도 발견되는 문양이라 아유타의 공주가 왕비로 왔다는 설화에 대한 증거가 되고 있다.

김수로왕릉의 쌍어문양
신라의 옛 궁궐터가 위치한 월성의 성곽 주변 연못인 해자에서는 1,600년 전쯤 것으로 보이는 터번을 쓴 아랍인 모습의 토우(土偶)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토우뿐 아니라 아랍인의 모습을 한 다양한 유적들이 왕릉에서도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로만 글라스(로마제국에서 제작되어 삼국시대 우리나라에 유입된 유리 제품), 왕의 무덤을 지키는 아랍인 모습의 무인 석상 등을 볼 때 당시 아랍과의 교류는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월성에서 나온 터번을 쓴 토우
그 외에도 다른 증거들이 있는데, 다리/다르, 궁둥이/궁뚱이, 엉덩이/엉뚜, 언니/안니, 아빠/아빠, 엄마/엄마 등등 고대 타밀어(드라비디아족의 언어)와 비슷한 400여 개의 어원을 비교한 연구도 의미 있다. 언어뿐 아니라 팽이놀이, 공기놀이, 자치기, 구슬치기, 숨박꼭질, 말타기, 사방치기, 수건돌리기 등의 놀이의 유사성도 문화교류 이외에는 설명이 어렵다.
가야 대성동 고분에서 순장(殉葬 : 왕이나 귀족의 무덤에 살아 있는 신하, 종을 함께 묻던 일)된 인골은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검사 결과 아랍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대 유전자이식연구소 김종일 교수의 분석 결과 이 인골의 유전자가 인도 남부의 타밀인의 유전자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인도인과도 유사한 것으로 밝혔다. 이 결과는 고대 한반도에 아랍인들도 함께 살았다는 증거가 된다.
한국인의 기원 문제와 관련된 연구 결과에서도 한국인의 유전자 중 시베리아를 거쳐 온 북방계 유전자가 60~70%, 해안을 따라 남부에서 올라온 남방계가 30~40%로 혼합되어 있다고 한다. 집단 유전자 풀의 비율은 세대를 거듭해도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경우는 미미한 정도의 돌연변이와 외부로부터 다른 유전자군의 유입이 있을 때나 가능하다. 결국 이런 유전자 비율은 한반도에 남방계 사람들이 30~40%나 함께 거주했으며 그들도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해 주는 것이다.
이 시기 우리 조상들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랍인들과 해상교역을 활발히 벌여 왔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조상들의 활동 영역은 작은 반도의 땅에만 갇혀있던 것이 아니라 드넓은 바다를 향해 있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 진취적 해상활동의 흔적은 무덤 속 인골의 유전자 속에, 멀리 서남아시아 사람들의 언어와 풍습에 그리고 우리들의 유전자에도 남아 그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탈에 남겨진 처용의 얼굴 또한 세계인으로서 한국인의 진취적 기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최은서(한성여중 교사, 국악박사)
<참고자료>
이홍구, 처용무(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화산문화, 2000.
김병모, 허황옥 루트 인도에서 가야까지, 역사의 아침, 2008.
이진아, 지구 위에서 본 우리 역사, 루아크, 2017
원혜영, 「바다 거북길을 따라서 : 타밀나둥데서 가야제국까지 허황옥 전설을 토대로 한 어휘적 근거와 문화를 추적하며」, 『동서비교문학저널』 제57호, 2021.
방민교, 「생물인류학 자료로 본 한국인 기원문제 대한 연구」, 『인문사회21』 제9권 3호, 2018.
이거룡, 「파사석탑 고찰」, 『동아시아불교문화』 34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8.
현재환, 「한민족의 뿌리를 말하는 의사들:의학 유전학과 한국인 기원론, 1975-1978」, 『의사학』 제;28권 2호, 대한의사학회, 2019.
가야 대성동 고분의 인골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분석
(https://www.youtube.com/watch?v=4c4R_Hygvmk)
블로그 우리 민족은 어디서 왔으며 우리 말은 어떻게 형성됐는가?
(https://blog.naver.com/silvino111/222014984245)
[국악무대] 국립국악원 무용단 - 처용무(Cheoyongmu) / 국립국악원 2021 새해국악연 벽사진경
(https://www.youtube.com/watch?v=Of7IFL8JhHA)
아시아투데이 2013.07.09. 장기철 이사장 “동양음악의 진수 ‘수제천’, 세계유산으로”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709010004539)
연합뉴스 2022.07.01. [K스토리] 신라에 터번 쓴 서역인이? '토우'로 보는 신라의 국제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