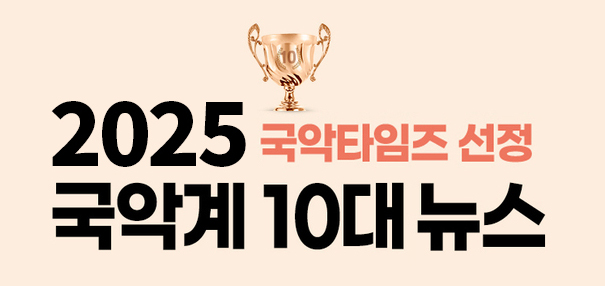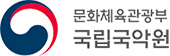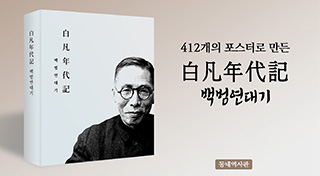한·일 선린우호(善隣友好)의 상징 조선통신사
11월 3일 일요일 아침 이곳 오카야마현(岡山縣) 세토우치시(瀬戸内市) 우시마도정(牛窓町) 데지마 공원(出島公園) 일대에서 조선통신사 재현행사가 개최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함이 생겨 먼 거리를 여행하게 되었다. 도착한 우시마도는 나의 예상과 달리 한적한 바닷가 시골 마을이었다. 이렇게 자그마한 항구가 조선통신사와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것일까?
조선통신사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총 12차례 파견되었는데, 12번째 조선통신사는 대마도까지만 파견되었고, 그 앞 11번은 도쿠가와막부(德川幕府)가 있는 에도(江戸: 도쿄)까지 왕복하였다. 왕복 길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는 긴 여정이었으며,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머문 기항지는 30~50여 곳이나 되었다. 우시마도는 조선통신사가 15번이나 기항한 곳이다.
2017에는 한·일 양국의 민간이 주도하여 조선통신사 기록물 333점(한국기록물 124점, 일본 기록물 209점)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그 가운데 우시마도의 기록물 9점도 포함되어 있어 그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
특히, 조선통신사 중 심부름을 하던 소동(小童)들이 추던 춤이 이 마을에서 보존되었는데 그 춤이 가라코오도리(唐子踊)이다. 이 가라코오도리는 1960년에 일본의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오늘의 행사에도 가라코오도리보존회(唐子踊保存會)는 협력 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이곳 우시마도의 조선통신사 재현행사는 1991년부터 2008년까지는 지방정부가 지원하여 개최되다 2009년에 지원이 끊겨 중단된다. 이 행사가 중단된 것을 안타깝게 여긴 시민들과 시민단체는 의지를 모았고 2010년 ‘세토우치(瀬戸内) 우시마도(牛窓) 국제교류(國際交流) 페스타(フェスタ 축제)’라는 명칭으로 재개하였다. 매년 11월 첫째 주 일요일마다 개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50~2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참가해 오고 있다.
올해의 행사도 축제 실행위원회가 주최하고, 고베 주재 한국 총영사관, 오카야마한국교육원 등이 공동주최자로 나섰고, 오카야마현, 세토우치시, 재일 대한민국 민단 오카야마현 지방본부, 우시마도정 어업협동조합 등이 후원하고 있다. 오카야마와 세토우치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문화예술단체, 민단학교, 조선학교 등 재일 한국인과 한국에 우호적인 일본 시민, 세토우치시와 자매결연을 한 밀양시 관계자, 밀양의 중·고등학생 농악단, 부산문화재단 등이 협력하여 이날의 공연 을 풍부하게 채우고 있었다.
음악으로 우호를 다지는 ‘세토우치 우시마도 국제교류 페스타’
‘세토우치 우시마도 국제교류 페스타’의 시작은 조선통신사 행렬의 재현으로 시작된다. 우선, 배를 타고 우시마도 항구로 들어오는 조선통신사의 모습을 연출한다. 배에서 내린 조선통신사의 국서(國書 : 임금이 보내는 문서), 정사(正使), 부사(副使), 종사관(從事官) 등이 가마에 올라타 아름다운 항구를 행진한다. 행진의 마지막은 통신사들이 묵었다던 혼렌지(本蓮寺)라는 절이다. 절에서는 에도(江戸: 도쿄)에서 있었을 국서(國書) 교환(交換) 장면까지 연출된다.

한복과 유카타가 어우러지는 단심줄꼬기
오후에는 데지마 공원(出島公園)에 설치한 가설무대에서 참가한 단체들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며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우호적 교린(交隣)을 기원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무용가 조영희 선생은 우시마도니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부채춤과 사물놀이를 가르쳐 2006년 행사부터 꾸준히 참여해 오고 있는데, 올해는 청주시와도 문화교류 물꼬를 터, 충북의 무형유산 1호인 청주농악단이 참여하였다. 신명 나는 농악가락에 채상 소고 놀음, 열두 발 소고춤 등 수준 높은 기량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특히, 공연의 마지막에 연출된 ‘단심 줄꼬기’는 행사 의미를 되짚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일본 전통의상인 유카타를 입은 일본 사람과 우리 한복을 입은 한국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한·일의 우호적인 교류를 기원하는 오늘 행사의 의미를 상징해 주는 듯했다.
사실, 지리적으로는 매우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이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를 거친 우리로서는 심정적으로 너무도 멀고도 먼 나라이다. 내가 직접 경험한 세월은 아니지만, 그 40년의 세월은 후손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통한의 세월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과오를 저질렀던 독일과 달리 우린 그들로부터 충분한 사과도 보상도 받지 못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선결될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화해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런 겨지에서 음악을 통한 문화교류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인이 사랑한 조선통신사의 음악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을 끝내고 얼마 지나지 않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2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파견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부산의 왜관을 벗어나 한양까지 갈 수는 없었지만, 일본의 사신이 조선을 수도 없이 방문하였다. 쇼군이 취임하는 국가적 행사를 축하거나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이 기간 조선과 일본의 양국은 그야말로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되었다. 이웃한 두 나라가 전쟁 없이 200년 이상 교린을 한 것은 세계사에 드문 일이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선통신사의 왕복 이동경로(출처 : 조선통신사 역사관)
왕복 만리(萬里), 1년이란 긴 여정이었다. 조선에서 파견된 인원은 적게는 300명 많게는 500의 인원이 파견되었다. 바닷길을 가기 위해 세척의 배를 완성하고 준비하는 데에 2년이 걸렸다고 한다. 임금에게 인사를 하고 부산까지 이동하는 여정에도 많은 문화적 유산을 남겼다. 일본에서의 이동은 뱃길과 육로가 모두 활용되었다. 육로로 이동할 때는 일본 정부에서 보내 준 호위무사와 짐꾼들까지 합세하면, 2,000명이 넘는 행렬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구경꾼들이 행렬의 시작을 관람해서 마지막까지 보는 데에만 다섯 시간이 걸릴 정도였다고 한다. 관람하기 좋은 자리는 매매되기도 했다고 하니 그 인기가 어떠했을지 실감하고 남을 만하다. 섬나라 일본에서 당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외국 문물이었으니 일생일대의 어마어마한 볼거리를 만나러 온 일본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조금은 상상이 된다. 가히, 한류의 원조는 조선통신사라고 칭해야 할 것이다.
1636년 사행부터는 마상재(마를 타고 보여주는 기예)와 전악(典樂 : 장악원의 궁중 악사), 남악(男樂 : 어린 남자아이들이 추는 춤)을 일본의 간바쿠(關白 : 일본 천황의 최고 보좌관)가 특별히 요청하여 파견하게 되었다. 마상재의 재주와 조선의 악공(樂工)의 연주 음악과 연희를 구경한 일본인들이 놀라고 기뻐하는 모습에 대한 기록도 전해진다. 에도까지 왕복하는 여정은 해류, 바람 등의 기상의 영향으로 길게는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다. 악공들은 머무는 지역의 왜인들을 위한 행사에서 연주했을 뿐만 아니라, 고된 사행길에 지친 조선 사람들의 고단함과 향수의 마음을 음악으로 위로해 주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조선통신사 행렬도의 취고수(1711년)
숙종 27년(1711년) 조선통신사 행렬도에 그려진 악공을 보면 행렬의 앞쪽에는 나팔수, 나각수, 태평소, 동고(자바라), 고타수(북), 삼혈수, 쟁수(징) 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행렬의 후미에는 해금, 고수(북), 필(피리), 저(대금), 쟁수(징) 그리고 말을 탄 전악(典樂 : 조선 궁중 장악원 소속 악공)이 따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행렬도의 삼혈수(三穴手)의 등장은 다소 특이하다. 들고 있는 것은 세발 연속으로 나가는 총으로 삼안총(三眼銃)이라고도 했으며, 취타대의 행렬이 출발할 때 총소리로 신호를 알렸다. 1795년 정조의 화성행차에도 취타대에 포수가 편성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악대의 구성은 임금님의 행차 시에 연주하던 취타대의 구성과 비슷하다. 임금님의 가마 앞쪽에서는 전부고취라 하여 취고수(吹鼓手)들이 배치되고 후미에는 후부고취라 하여 세악수(細樂手)들이 배치되었다. 취타대는 임금의 행차 이외에도 군대의 행진에도 쓰였고 취타, 길군악, 길군악, 별우조타령, 군악 등의 악곡을 연주하였다.

조선통신사 행렬도의 세악수(1711년)
조선통신사의 악기편성도 취타대와 유사한 점을 보아 이와 같은 악곡을 연주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사행에 함께한 행악(行樂)에는 적게는 22명(1607년)에서 최대 75명(1763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다. 길고 긴 행렬에 우리 악대가 연주하는 고취악으로 마치 조선의 임금님이 행차하는 것처럼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했을 것이다. 생전 처음 보는 어마어마한 행렬과 처음 듣는 음악에 구경나온 일본인들의 마음과 심장을 울려 평생의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았을 것이 분명하다.
1719년 사행에 참여한 신유한이 기록한 해유록(海遊錄)에 국서를 실은 국서선(國書船)에서 거문고, 대금, 비파, 북, 장고, 피리의 악기로 연주한 내용이 적혀있어 고취악 이외에도 다양한 연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연주곡목은 알 수 없으나 느린 음악의 분위기를 완성지곡(緩聲之曲)이라 표현하였다. 1764년 통신사 일행이 요시하라(吉原)에 머물며 밤새 승려를 위해 베푼 음악에 대해 제술관(製述官 : 글을 쓰는 사신단 수행원)이었던 남옥(南玉)이 ‘여민락(與民樂)’이라 답한 기록이 있다. 여민락은 세종대왕이 지은 악곡으로 임금이 출궁할 때나 환궁할 때, 궁중에서 연향을 베풀 때 연주되는 아름다운 곡이다.
일본의 문화재가 된 조선통신사 소동(小童)의 춤 가라코오도리(唐子踊)
조선통신사의 음악이 일본에 남긴 영향은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조선통신사 행렬 자체를 흉내 내 북과 징을 치고 피리를 불며 행진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다. 미에현(三重県)의 츠시(津市)와 스즈카시(鈴鹿市) 두 곳의 마쓰리(祭 : 마을 축제)에서 도진오도리(唐人踊)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음악과 춤을 재현한 것으로 오카야마현(岡山縣) 세토우치시(瀬戸内市) 우시마도정(牛窓町)의 가라코오도리(唐子踊)이다. 조선통신사의 소동대무(小童對舞)의 음악과 춤을 재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동(小童)은 경남 일대에서 15~6명 정도 모집된 10대의 어린 남자아이들로 주로 심부름을 하였고, 연회에서는 춤을 추기도 하였다. 소동대무(小童對舞)는 조선통신사로 파견된 소동 둘이 서로 마주 보고 추는 춤으로 마상재와 함께 인기 있던 조선통신사의 공연물이었다. 일본에서는 특별히 남악을 요청할 정도로 이 춤은 인기가 있었다. 여자처럼 장삼을 길게 하여 춤 추기도 하고, 전립에 쾌자를 입고 추기도 하였다. 우시마도(牛窓)의 마쓰리에서 가라코오도리(唐子踊)라는 명칭으로 이 춤을 재현하였는데 일본의 중요무형문화재가 되었다.

조선통신사 소동대무(1711년)

가라코 오도리(https://youtu.be/Z4L8jU2nesc?si=Z6dTevCbNyGn6ZIo)
현재 전승되고 있는 가라코오도리(唐子踊)는 조선통신사가 다녀간 지 300년이 지났음에도 춤 동작, 춤을 추는 소년이 외치는 구호, 가사 일부에 한국적 요소가 남아있는 점, 반주의 선율이 우리 음악 평조와 닮은 점, 조선의 예악사상의 영향을 받은 일본 아악 가가쿠와 유사한 음계를 사용하는 점, 리듬 꼴에서 우리 엇모리장단에서 볼 수 있는 2+3 구조의 혼소박이 등장하는 점 등 등이 조선통신사에서 기원한 춤임을 증거하고 있다.
한·일 간의 우호적 관계 회복을 꿈꾸는 조선통신사 역사관
일본을 다녀온 후 조선통신사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부산의 조선통신사 역사관을 찾았다. 겉모습과 달리 역사관은 너무도 소탈하여 전시된 물품으로는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감흥을 받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먼 거리를 운전해 온 피곤함이 겹쳐 실망하던 찰나 학예연구사님이 다가와 긴 시간 차분히 그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본 칼럼을 빌어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매년 5월 첫째 주 주말에는 부산에서 주관하여 다양한 조선통신사 재현행사가 벌어진다고 하니 내년이 기대된다. 이래저래 공부한 내용을 보태보고자 한다.

때는 14세기 전 지구적으로 추워진 날씨 탓으로 대기근이 닥쳤다. 배고픈 왜구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 고려 땅뿐만 아니라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해적질을 감행했다.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몽주가 일본에 파견되기도 한다. 결국 가혹한 날씨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했다. 정도전은 개경과 경기도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고 나눠주는 토지개혁으로 한랭기가 준 위기를 극복하며 조선 건국의 명분을 얻었다. 태종 이방원은 부산에 왜관(倭館)을 열어 왜인들이 해적질이 아니라 교역을 통해 먹고 살도록 해주어 왜구 문제를 해결한다. 일본에서는 국왕사라는 이름의 사신을, 우리는 통신사(通信使), 보빙사(報聘使), 회례사(回禮使), 회례관(回禮官), 경차관(敬差官) 등 다양한 이름의 사신을 보내 외교적인 문제를 서로 해결해 나갔다. 역사의 아이러니인가 이때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가 왕래하던 한양길이 임진왜란의 침략로(侵略路)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의 전쟁은 이순신 장군이 활약한 조선의 승리로 종결되고, 패전한 일본에서는 권력의 전환이 일어났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새롭게 쇼군(천왕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실질적 통치자)이 되면서 에도 막부시대가 열린 것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새로운 쇼군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국제적으로 확인 받고, 언제 등을 돌릴지 모르는 다이묘(大名 : 영주)들의 힘을 뺄 필요가 있었다. 조선통신사의 방문은 이 두 목적 달성에 더없이 좋았다. 임진왜란에 참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조선에 요청할 명분도 있었다.
조선통신사의 일본 체재 비용은 모두 일본이 감당하였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7,000억원에 이르며 당시 일본의 1년 재정을 넘는 규모였다고 한다. 도쿠가와는 그 막대한 비용을 조선통신사가 머무는 지방의 다이묘들이 감당하도록 하여 그들의 경제력을 약화하는 효과를 얻었다. 게다가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머무는 기간 동안 일본의 주요 도시를 돌며 선진 문명국의 사절단이 시끌벅적하게 자신의 쇼군 등극을 축하하며 통치 명분을 쌓아주니 얼마나 훌륭한 계략인가?
조선은 비록 왜란에서 승전하였지만, 우리 국토를 유린한 일본과 국교회복까지 하는 것은 탐탁지 않았다. 하지만, 북쪽에 여진족은 금나라를 세워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었다.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맺어야 북방의 위협에 집중할 수 있었다. 병자호란이 일어난 1636년에도 475명의 조선통신사가 파견됐음은 이를 반증한다. 게다가 억울하게 포로로 끌려간 동포를 쇄환(刷還)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였다. 일본으로 끌려가 노예가 된 이가 무려 10만도 넘어 세계 노예시장 가격을 1/6로 하락시킬 정도였다는 통탄해 마지않을 이야기도 전한다.
이런, 양국의 이러한 이해관계는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를 통한 상호 신뢰 구축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냈다. 그런데, 이 관계 회복 과정에 쓰시마번주(對馬藩主)의 문서위조가 톡톡히 한몫을 했다. 대마도는 농사하기에는 척박한 땅이라, 양국이 관계를 회복 해 조선과의 교역 빨리 재개되기를 번주는 절실히 원했다. 그러나 통신사의 파견은 서로 먼저 국서를 보내라는 명분 싸움때문에 진척되지 않았다. 이에 쓰시마번주는 조선의 국왕에게 쇼군이 먼저 보낸 것으로 위조한 국서를 보내고, 임금에게 받은 답서를 마치 조선에서 먼저 보낸 국서인양 쇼군을 속인다.
조선은 일본에 성리학, 시문학, 의학 등 우리가 앞서 있는 문화를 전파하여 그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주기적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오사카, 나라, 에도의 번영한 도시, 우리보다 앞선 인쇄술에 놀라기도 하고, 온난다습한 날씨가 선물한 대단한 국가의 경제력도 확인하며 미개하게만 보던 일본에 대한 시선을 달리하게 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유지가 되던 두 나라의 화친은 일본에 닥친 기근, 조선통신사를 맞이하는 경제적 부담, 대항해 시대에 새롭게 조우(遭遇)한 서구 문명의 유입, 더 이상 조선으로부터 배울 게 없어진 상태 등 등이 이유가 되어 중단된다. 조선통신사가 중단된 100년 뒤,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던 우리는 결국 고통의 세월을 감내하기에 이르렀다.
빠르게 성장한 대한민국 이제, 우리의 문화는 세계의 주류가 되었다. K-컬쳐는 음악, 음식, 드라마, 영화,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러움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계와 소통하지 않고 고립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위태롭게 만드는지 우린 역사를 통해 배우고 경험했다. 우린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세계적인 강대국을 이웃으로 두고 있다. 조선통신사가 그러했듯 이들과 지속적인 문화적 교류를 만들어 내고 모두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세계인으로 살아가는 날을 기대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참고자료>
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 『朝鮮時代 通信使 行列 :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조선토힌사 문화사업회, 2022.
유성운, 『한국사는 없다』, 페이지2북스, 2024.
조영희. 「일본 우시마도(牛窓) 조선통신사 행렬 행사의 현황 연구」,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 2021.
김은자. 「朝鮮時代 使行을 통해 본 韓·中·日 音樂文化」,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2011.
문경철. 「朝鮮通信使로 본 韓日文化交流 - 唐人춤과 唐子춤을 中心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2011.
임혜정. 「일본 우시마도초(牛窓町) 가라코오도리(唐子踊り)와 조선통신사의 음악」, 동양음악 제45집, 2019, 65~84쪽.
김성혜. 「1711년 조선통신사 '등성행렬도'의 취타수 연구」, 진단학보 113집, 2011, 129~162쪽.
[KBS다큐 - 조선통신사 평화의 길] https://www.youtube.com/watch?v=wqi5QoQ7P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