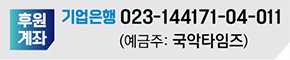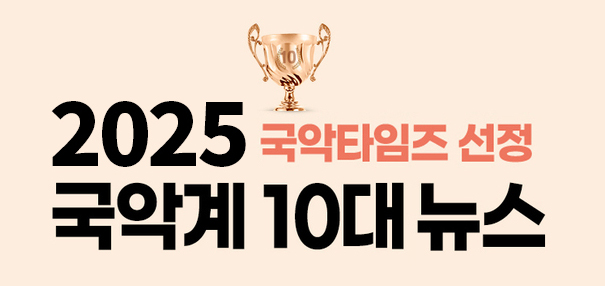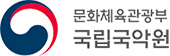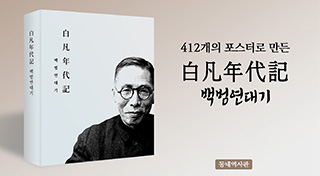노벨상 수상자 한강의 ‘흰’ The Elegy of Whiteness 흰빛 시나위의 구슬픈 한국적 恨
노벨상 심사위원장 안데르스 올손 위원장은 "한강의 소설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거대한 질문을 담고 있다"고 밝히며, "한강의 작품에서 반복되는 것은 윤리적 차원과 인간의 고통에 대한 강한 감각"이라고 강조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출처 : 경향신문)
그는 "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문제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예술적으로 설득력 있게 현실을 표현해 내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이는 ‘흰’이 단순히 철학적 사유를 넘어 예술적으로 인간의 고통과 이를 초월하려는 의지를 설득력 있게 표현한 작품임을 시사한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는 ‘3,0,1’의 상징
한강의 작품 ‘흰’에서 문에 새겨진 '301'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오래되어 긁힌 방의 호실이 아닌 삶과 그 너머의 경계의 공간으로 등장한다. 한강 작가는 이를 통해 인간 존재의 유한성과 무한성, 그리고 이를 초월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담아냈다.
김지원(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2015년 발표한 ‘흰색의 표상’이라는 논문에서 전통예술의 맥락에서 살풀이춤, 지전춤, 승무, 학춤 등의 유독 흰색의 무복과 하이얀 고깔, 흰 버선 등의 상징적 메시지와 한민족의 백(白)의 미학적 의미를 승화의 세계관과 연결 지었다.
전통 예술에서는 슬픔과 한(恨)을 삭임(解消)으로 풀어내어 ‘한’이라는 의미의 해석도 왜 눈(雪)처럼 시린 것인지, 이는 한강의 ‘흰’에서 흰색의 상징과 함께 구현된다.
흰 눈, 한국적 사유와 철학적 세계관의 매개체
한강의 ‘흰’에서 중심적으로 다뤄지는 ‘흰’은 단순한 색채가 아닌 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지닌다. 한국 전통에서의 흰색 또한 삶과 죽음, 순수와 초월을 상징하는 도상이자 백의민족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은 소복, 달항아리, 백자와 같은 전통적 예술에서 흰색의 무한한 가능성을 긍정의 미감(美感)으로 초월하고자 하는 빛이다.
한국 전통의 장례문화에서도 흰색의 소복은 죽음이라는 어둠과 슬픔의 검은 빛과는 대조되는 차이로 ’영원불멸‘의 생장의 상태, 곧 삭임의 극복과정이다. 이러한 흰색의 상징은 삼수세계관(Three-Part Worldview)과 화쟁의 원리(Principle of Hwa-Jaeng)와 같은 한국적 철학 체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삼수세계관은 모든 사물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며, 이는 흰색이 가지는 순수성과 무한성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
한강의 작품에서도 흰색은 상실과 애도의 감정을 표현하는 동시에 희망과 재생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이는 전통적인 예술에서 한과 슬픔을 삭임으로 풀어내고 승화로 나아가는 과정과 닮아 있다. 이렇듯 흰색은 한국적 사유와 철학적 세계관을 매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정중동과 삭임의 철학
한국 전통 춤에서는 정중동(靜中動)의 개념이 강조된다. 이는 고요함 속에서 움직임을, 움직임 속에서 고요함을 찾는다는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한, 춤의 맺고 푸는 과정은 '삭임'이라는 철학적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
3이라는 숫자는 0이 갖는 공(空)의 개념, 저 너머의 승화라는 극복의 과정에서 2분법적 모순이 아닌 하나를 더 두는 중(中)-1의 개념이다. (2006. 저서,한국춤의 코드와 해석 내용)
이러한 개념은 한강의 작품에서도 인간의 슬픔을 극복하고 승화하려는 의지의 언어적 함의로 해석된다.
'흰'에서 흰 페인트를 덧칠하려는 행위의 과정은 삶의 무게를 삭임으로 승화시키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러다보니 아직 남아 있는 얼룩의 지난한 흔적을 흰 페인트로 덧칠하려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꽃을 멍하게 바라보며 언어의 시간은 침묵한다.
문학과 전통 예술의 융합, 언어와 몸짓 발화의 한국적 ‘흰’
이 기사에서 문학과 예술은 상응적(相應的)으로 다루어진다. 문학은 한강 작가의 작품 '흰'을 중심으로, 예술은 전통 예술에서 흰색의 미학적 의미를 연구한 김지원의 논문을 기반으로 한다.
이 두 분야는 흰색이라는 상징을 통해 서로 대화하며, 한국적 사유와 세계관을 상통적(相通的)으로 조명한다. "한의 시리도록 슬픈 감정은 하늘에서 나리는 눈(雪)의 고요한 속도와 어우러지며, 그 여운은 여백의 미를 넘어 감각적인 울림을 남긴다."
김지원 교수는 한강의 작품에서 발견한 공통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강의 목차를 보고 놀랐습니다. 눈 설(雪), 강보, 배내옷, 서리, 소복, 흰새 등 목차가 연구 논문의 내용 중 한과 관련한 시리도록 차가운 감정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는 한강의 소설 ‘흰’이 인간의 슬픔을 승화하고 극복하려는 전통 예술의 정신과 상통한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흰색’은 한국 문화에서 순수함과 시작을 상징함과 동시에 죽음과 허무를 암시하는 다층적(多層的)인 의미를 지니며, 이를 통해 삶과 죽음, 상실과 치유의 주제를 탐구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그는 소설에 나타나는 ‘301’이라는 메타포가 시적 은유로서 작용하며, 자신이 논문에서 다루었던 정한(情恨)의 철학적 해석과도 부합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메타포는 작품의 상징성을 한층 심화시키며, 독자들에게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소설이 단순히 서사적 층위를 넘어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깊이를 지닌 작품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가도록 만드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언어 기호와 몸의 기호가 서로 통하며, 춤이 몸의 철학적 표현임을 강조하며 ‘흰’이 이를 보완적으로 설명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강의 소설 '몽고반점'은 들뢰즈의 철학과도 일치하며, 춤의 몸 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살풀이춤을 추는 김지원 교수
한강의 문학은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전통 예술의 철학적 메시지와 세계관을 융합하여 독창적이고 보편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낸다. 춤이 몸의 기호를 통해 의미를 발현하는 예술이라면, 한강의 작품은 언어와 서사를 통해 이를 보완적으로 표현한다.
특히, 한강의 ‘흰’에서 등장하는 '301', ‘눈(雪)’의 메타포는 저자의 글에서 ‘영원불멸’인 무(無)와 허공의 개념과 맞닿아 있으며 전통 예술의 삼수세계관과 화쟁과 같은 한국적 세계관의 연장선상에 미학적 구조와도 연결된다.
한편, ‘흰’ 소설과 관련하여 김지원 교수의 2011년 창작공연 '호접몽(蝴蝶夢)'의 안무 의도는 한강과 철학적 맥락에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나비의 꿈은 현실과 환상을 넘나들며 인간의 존재와 무(無)의 경계를 탐구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으며, 이는 한강의 ‘흰나비’ 와 작품이 전달하는 삶과 죽음, 허공의 철학적 메시지와 맞닿아 있다.
한강 문학의 보편성과 한국적 정체성
전통 예술에 대한 논거(論據)는 김지원의 2015년 논문 ‘한국춤에서 흰색의 표상과 미적 의미 연구’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 다루려는 문제의 핵심은 한강의 작품 흰의 상징성을 전통 예술에서 다루는 흰색의 철학적·미학적 의미와 연결 지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정서적 기반을 새롭게 조명하는 데 있다.
나아가, 2015년 논문은 '흰'의 상징적 의미가 한국예술의 내면의 공허가 여백의 미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논증하였다."
"한강 작가의 작품은 한국 전통의 철학적 사유와 예술적 감각을 현대 문학으로 녹여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흰'은 인간의 한과 슬픔, 그리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아내며, 동시에 전통 예술이 추구하는 긍정의 빛, 즉 흰빛을 통해 승화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러한 보편성과 한국적 정체성의 조화는 ‘흰’을 단순한 문학 작품을 넘어 한국 전통의 사유를 세계 문학에 소개하는 매개체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살풀이춤을 추는 김지원 교수
철학적 예술로서의 ‘흰’
한강의 ‘흰’은 한국 전통 예술과 철학적 세계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독창적 문학 작품으로 구현한 사례다. 이 작품은 김교수의 논문에서 제시한 흰색의 상징성과 삼수세계관, 정중동(精中動)을 통해 인간의 슬픔과 승화의 의지를 탐구한다. 또한, 인간의 고통과 윤리적 차원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며, 한국전통의 사유를 현대 문학과 결합하여 보편적 메시지를 창출한다.
‘흰’은 한국 문학의 철학적 깊이와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며, 한국적 사유를 재조명하고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예술적 방향을 제시한다. 한강의 작품 ‘흰’과 김지원 교수의 2015년 논문은 문학과 전통 예술이 흰색이라는 상징을 통해 상통(相通)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한국 전통 춤의 삼수세계관과 정중동의 개념을 통해 흰색이 인간의 한과 슬픔을 승화하는 과정의 상징임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한강의 작품은 문학적 서사를 통해 이러한 철학적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이 기사는 문학과 전통 예술이 공유하는 상통성을 국악인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한강의 소설 ‘흰’과 김 교수의 연구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흰색이 지닌 깊은 철학적·미학적 의미를 재조명함으로써, 한국 예술의 본질을 탐구하고 그 세계적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작품과 연구에서 나타난 상징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은 한국 전통 예술의 정신적 깊이와 현대 문학의 보편성을 연결하며, 예술적 정체성과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국악인들에게 전통 문화가 세계적인 예술 언어로 확장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한국 예술의 정체성과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지원의 창작초연도 홍과 백을 시작으로ㆍ동백은 피고나고ㆍ나비야 청산가자ㆍ참춤ㆍ호접몽ㆍ기억ㅡ이어짐 등 흰과 붉음의 차이를 통해 순수와 욕망의 인간 내면을 대비시키고 나비라는 꿈의 현상을 통해 이세계와 저세계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김지원의 첫 학술발표인 2002년 니체의 사상 '영윈회귀'에서 살풀이춤의 순환적 삶의 궤적을 설명하고 있다는것이 삶과 죽음에 관한 한국전통예술의 세계관과 한강의 접점은 다르지 않다
김지원 교수는 2006년 ‘한국춤의 코드와 해석 내용’ 2011년 ‘춤은 말한다’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되었으며, ‘한국춤에 빠지다’ 저서 등으로 주목받은 학자다. 그는 무용학(무용기호학)과 행정학(예술정책) 분야에서 두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학문적 깊이를 더해왔다.
그의 연구는 한국춤의 미적 해석과 정책적 접근을 통해 전통 예술의 보존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그의 연구는 춤의 기록과 전승에 중점을 두며, '김지원 무보'라는 독창적 체계를 통해 한국무용의 보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업적을 바탕으로 그는 대한민국 기록문화 대상 창조융합 부문을 수상하며, 전통 예술 보존과 기록문화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교수는 한(恨) · 삭임 · 엇박 · 신명 · 해학 · 곡선 · 여백등에 관한 한국전통예술의 미학을 탐구하며 그간 공저포함 8편의 저서와 6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고 2024년 한밭국악대전에서 '살풀이 춤'으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악타임즈의 모든 기사는 5개 국어로 실시간 번역되어 세계와 소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