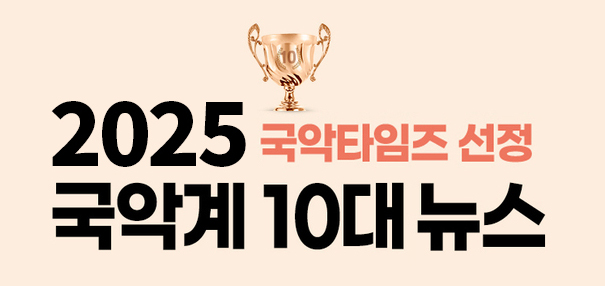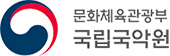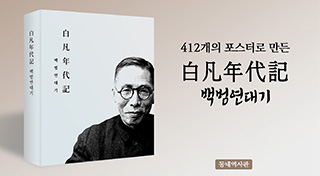돈의 신
2025년 2월 14일~15일 양일간 서울남산국악당에서 3회에 걸쳐 펼쳐진 국악 모둠 우리소리 ‘바라지’의 창극(唱劇) <돈의 신>은 창극역사에 새로운 한 획을 긋는 창조의 물줄기였다. 현시대가 요구하는 무대예술의 표상으로 출연자와 관객이 함께 호흡하며 즐거움과 기쁨을 만들고 행복을 나누는 최고의 향연이었다.
창극은 판소리꾼들의 전유물로 판소리 창자들이 무대에서 역할을 나눠서 판소리조로 소리하며 연기하는 우리 전통 극의 한 분야이다. 이 창극을 기악중심 소리 모둠 우리소리 ‘바라지’의 연주자들이 각각 소리꾼이 되어 기악연주와 소리를 함께하는 연기로 관객에게 감동을 선물하는 신선한 무대를 선보였다.
전통음악에서 음악을 이끌어가는 주된 소리에 어우러지는 반주자들의 즉흥적인 소리를 뜻하는‘바라지’는 다른 사람을 도와서 뒷바라지한다는 순우리말에서 따온 것이다. 음악감독 한승석과 소리꾼 김율희를 제외하고 아쟁-조성재 / 타악(쇠, 북, 장구, 징)-강민수·이준형 / 대금-정광윤 / 피리-오영빈 / 가야금-최은혜 구성원 모두가 우리전통 국악기를 연주하는 젊은 국악인이다. 진도씻김굿과 동해안별신굿 등 우리전통 음악을 현대 감성에 맞게 추리고 다듬어 재구성하고 창작하여 전통 속에서 시대흐름을 이어가며 국악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

<돈의 신>은 기원전 388년 공연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리스 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부의 신>에서 ‘부의 신이 장님이라는 것, 부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구별 없이 있다는 것, 부는 절대적으로 평등하지 않고 도덕성과 부가 반드시 반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서 착안하였다.
초상집 발인 전날 밤 상가 마당에서 슬픔에 빠져드는 상주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망자의 황천길 안녕을 빌어주기 위한 신청(神廳) 재비(굿쟁이)들의 해학적 풍자 상여놀이판 ‘다시래기’의 가상제, 땡중, 사당 / 신이 되어버린 심청전의 심황후 / 눈먼 돈의 신을 등장인물로 하여 부가 지닌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며 인간이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여망이 무엇인지를 전통해학과 풍자로 보여준다.
암막이 걷히며 무대 앞 연기 공간의 뒤편 중앙에 통로 길을 두고 좌우로 아쟁, 양금, 가야금, 대금과 그 뒤 돋음 무대에 가야금, 북·장구·징 등 타악기가 자리 잡고 태평소 3개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더니 약 10여분 가까이 ‘바라지’의 신명나는 기악연주가 펼쳐졌다. 아쟁, 피리, 가야금, 양금, 타악, 태평소 순서로 독주가 흥을 달구며 <돈의 신> 문을 열어 감탄사를 쏟아 내게 했다. 타악 연주에 곁들여 춤을 추는 요령울음과 가야금을 함께 타던 소리꾼 김율희는 화룡점정이었다.
평생 가난으로 굶주리다 외로운 죽음을 맞은 박대출이 진도 ‘다시래기(중요무형문화재 제81호)’로 되살아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박대출은 <돈의 신>에게 ‘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내리지 않고 부당한 사람들에게 부를 축적하게 하는지’ 물으며 가난한 사람에게 돈벼락을 내려 달라한다. 눈먼 돈신은 회피하려 하지만 인당수에 계신 심황후신이 눈을 뜨게 하면서 돈벼락이 쏟아진다. 돈에 둘러싸인 사람들의 삶의 애환이 펼쳐지고 가난과 부의 문제, 부의 불균형, 돈의 불공정성은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난제이며 변하지 않는 현재진행형의 화두이지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부의 가치를 전달했다.


창극 구성에 묻혀 자칫 아쉬움으로 남길 수 있었던 ‘바라지’의 본성, 탁월한 기악 연주 중 하나인 ‘네 명의 고수가 두들기는 북 가락’의 생생함 넘치는 아름다움을 펼쳐 보인 극 중간의 구성은 관객의 욕망을 채워주는 백미였다. 농악놀이, 사물놀이, 판소리 어디에서도 단조롭고 단순하게 느껴지며 소리의 변화를 크게 느낄 수 없는 북소리도 공연예술의 한 자리를 꽉 채웠다. 현란하며 다양한 북 놀음의 폭발은 국악의 매력과 무한한 가치를 실증해 보였다. 북이 그냥 두들기는 악기가 아니라 생활 속 흥을 만들어주는 즐거움의 도구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우리전통예술의 창극을 개방형 멀티 형식으로 구성하여 작품 속 모든 연주자가 무대와 연주석을 넘나들며 배우·악사·소리꾼·춤꾼 등 멀티코러스로 참여하며 관객까지 무대 위 동반자로 끌어들여 박수·환호·웃음으로 유쾌하게 풀어주며 가슴 한가득 알 수 없는 뿌듯함으로 채워주어 ‘바라지’ 창극 <돈의 신>의 여운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다.

‘바라지’를 탄생시켜 우리 전통 악기를 연주하며 우리 소리, 우리 춤, 우리 모습을 창극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며, 국악의 옳은 미래의 길을 보여주고, 기쁨을 선물한 <돈의 신>를 무대에 올린 한승석 음악감독과 ‘바라지’ 가족, 수고하신 모든 관계자, 남산국악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경의를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