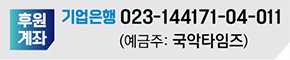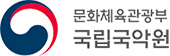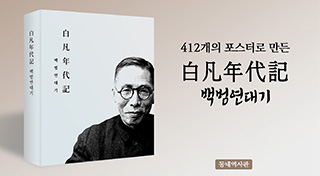뚝섬, 동묘 그리고 무신(武臣)의 제례악
뚝섬
뚝섬은 섬은 아니지만, 큰 비가 오면 한강이 범람하여 섬처럼 보이던 곳이었다 한다. 다른말로 ‘살곶이벌’이라고도 불렸는데 다음과 같은 일화 때문이다. 태종 이방원은 아우 둘과 정도전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화가 난 아버지 이성계는 자식인 태종과 인연을 끊고 함흥으로 떠나 버렸다. 태종은 아버지의 환궁을 권하기를 2년이나 지속했다. 이를 권하기 위해 함흥으로 갔다가 살아오지 못한 신하를 함흥차사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이다.
무학대사의 간청에 못 이겨 서울로 돌아오던 이성계는 뚝섬 근처에서 마중 나온 태종을 마주하게 되고, 분노를 참지 못해 아들을 향해 화살을 날렸다. 그 화살이 태종이 피한 기둥에 꽂히니 그 뒤로 이곳을 화살이 꽂힌 벌판이라는 뜻으로 ‘살곶이벌’이라고도 불렀다 한다. 임금이 매사냥을 즐기던 사냥터였기에 화살이 많이 꽂혀서 생긴 이름이란 말도 있지만 신궁(神弓)이라 불리던 태조 이성계의 화살 이야기가 더 드라마틱하다.

뚝섬 수도박물관에 설치된 둑기(纛旗)
조선시대 이곳 뚝섬은 병사들을 사열하는 연무장(演武場)을 두었던 곳이기도 했다. 지금도 연무장길이라 불리는 도로명이 있어 그 역사를 증거한다. 연무장 근처에는 둑신사(纛神祠)라는 사당도 있었다고 전한다. 둑신사는 둑제라는 제사를 지내는 사당인데 뚝섬은 둑신사가 있는 섬이라는 뜻의 지명이다. 이곳에 있던 둑신사는 안타깝지만 1927년 을축년 대홍수 때에 물에 잠겨 소실되었다 한다.
뚝섬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정수장을 만들고 상수도를 서울에 공급한 것을 기념하는 수도박물관이 있다. 이 박물관 초입에 뚝섬이란 지명의 연원을 설명하는 둑기(纛旗)가 조형물로 서 있다. 그 모습이 반갑기도 하였지만 과거 기를 보관하고 제를 지내던 사당도, 제단과 담벼락도 없이 덩그러니 기(旗)만 서 있는 모습이 처량 맞게 느껴졌다.
전쟁의 신
둑(纛)은 군권을 상징하는 기(旗)를 말한다. <세종실록>에는 둑의 모양을 치우(蚩尤)의 머리를 상징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치우는 중국 고대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으로 소의 뿔, 구리로 된 머리와 쇠로 된 이마, 6개의 팔, 4개 눈 등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긴 장대 끝에 뾰족한 창끝을 드러내고 검은 소의 꼬리털을 사방으로 늘어뜨린 것이 마치 머리칼 같은 둑의 모양새와 같아 뿔이 난 치우의 머리라고 상상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둑신(纛神)의 뿔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단창에서 삼지창으로의 변하는 양상을 보였다. 둑은 둑제(纛祭)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조선 후기에 와서는 군 통수권을 상징하는 기로 사용되어 정조대왕 능행차도, 조선통신사 행렬도 등의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투구 끝의 장식에도 전쟁의 신인 둑이 있어 무관들이 가졌을 승리의 염원이 느껴지는 듯하다.

세종실록의 둑 조선통신사 행렬의 둑 투구 위의 둑 (전쟁기념관)
2002년 월드컵 응원단인 붉은악마 마크도 전쟁의 신 치우를 상징한 도안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붉은악마의 마크는 삼국시대 건축물의 처마끝에 달았던 짐승 얼굴 무늬 기와(怪獸面瓦)에서 따온 도안이다. 이 도안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건축물에서 나타나는데 귀신을 쫓고 재액을 방지하는 벽사(辟邪)의 의미를 담고 있다.
2002년 붉은악마는 이 기와의 얼굴이 치우일 것이라는 유사 역사서의 가설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유사 역사서가 당시 유행한 환단고기인데 역사학계에서는 이 책을 위서(僞書)로 보고 있다. 이를 믿는 사람들은 이 기와의 무늬가 치우천황이며 우리 조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기와의 무늬가 중국 고대 신화에 나오는 치우라는 증거도 치우천황이 우리 조상이라는 증거도 아직은 없다.

짐승 얼굴 무늬 기와 (국립중앙박물관) 붉은 악마 마크
둑제(纛祭)를 지내는 섬, 뚝섬!
둑기의 가장 오래된 기록은 춘추전국시대 진(秦)나라 임금 양공(襄公)이 만들어 사용한 것에서 비롯된다. 둑제는 한나라 유방이 전쟁의 신 치우에게 제사를 지내며 승리를 기원한 기록 등으로 보아 중국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 둑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사기》 후백제 견훤 편에 등장하며, 고려시대에는 《고려사》에 고종 때 둑기(纛旗)를 세워 군사를 모집했다는 기록이 있다. 둑제를 지낸 가장 오래된 기록은 13세기 여몽연합군이 두 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출정하기 전에 지낸 것이며, 공민왕 이후에는 매달 두 차례 둑제를 지내 과도한 비용 문제로 둑사(纛祠)를 혁파했다는 기록도 전한다.
조선시대 첫 번째 둑제에 대한 기록은 태조 이성계가 건국 7개월 만에 홍둑(紅纛)과 흑둑(黑纛)을 만들어 둘째 아들 이방과(정종) 주관하에 모두 무관복을 입고 지내게 한 내용이다. 두 번째 둑제는 그 이듬해 군권을 책임지던 정도전 주관하에 모두 철갑(鐵甲)을 입고 지냈다는 기록이 전한다. 정기적인 둑제는 매년 3월 5일경인 경칩(驚蟄)과 10월 24일경인 상강(霜降)에 봄가을로 지냈다. 이 밖에도 군대의 출병 시에도 승전을 기원하며 지내기도 했다. 둑제는 유일하게 무관들이 주관하여 지내는 국가 제사로 길례 중 소사에 속하였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는 조선 시대 의례를 설명한 책으로, 이 책에서는 의례를 성격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 제사 예법인 길례(吉禮), 왕의 즉위, 세자 책봉, 왕실 혼례 등 경사스러운 의식인 가례(嘉禮), 외국 사신 접대 의식인 빈례(賓禮), 군사 의식 군례(軍禮), 장례 의식 흉례(凶禮)로 구분된다. 둑제(纛祭)는 둑에 지내는 제사로 길례에 속하며,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 중에서는 규모가 작은 소사(小祀)에 해당했다. 제사가 끝난 뒤에는 음복연을 열어 술과 음식을 대접했으며, 문신들이 공자에게 제사를 올리던 석전대제의 음복연과 비슷한 규모가 되도록 하여 균형을 맞췄다.
조선 건국 후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면서 둑기(纛)는 무예 훈련장인 강무당(講武堂)에 보관되었다. 이후 병사들의 사열을 위한 연무장(演武場)과 임금이 매사냥을 즐기던 사냥터였던 살곶이벌에 둑신사(纛神祠)가 세워지면서, 둑기를 이곳으로 옮겨 보관하며 둑제를 지냈다. 살곶이벌은 장마철마다 물이 범람해 섬처럼 변했으며, 이로 인해 "둑신사가 있는 섬"이라는 뜻에서 "뚝섬"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순신 장군의 둑제(纛祭) ; 울려 퍼진 납씨곡, 정동방곡
둑기를 보관하는 장소는 둑소(纛所), 둑소묘(纛所廟), 둑사당(纛祠堂), 둑신사(纛神祠) 등으로 불렸다. 이러한 둑소는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 각지에 있었으며, 지방 병영에서도 둑제를 지냈다. 특히 제주도에는 둑소가 무려 10곳이나 설치되어 지역 토호들의 본거지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평소에는 둑소에 보관되던 둑기는 둑제를 지낼 때 꺼내 제단으로 옮겨 제사를 지냈다.
우리 민족 전쟁의 신이라 할 수 있는 무패의 이순신 장군도 전라좌수영에서 세 차례 둑제를 지낸 기록을 《난중일기》에 남겼다. 제단에는 홍둑과 흑둑 각각 한 개씩 두 위(位)를 세우고 제례 절차에 따라 정도전이 지은 악장에 곡을 붙인 〈납씨곡(納氏曲)〉과 〈정동방곡(靖東方曲)〉을 연주하였다. 〈납씨곡〉은 원나라 장수 나하추를 이성계가 물리친 공적을 기리는 가사에 음악을 붙인 곡으로, 세 차례 술잔을 올리는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의 절차에서 연주된다.
제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간척무(干戚舞, 방패와 도끼를 들고 추는 춤), 궁시무(弓矢舞, 활과 화살을 들고 추는 춤), 창검무(槍劍舞, 창과 검을 들고 추는 춤)를 차례로 추며 진중한 예악의 분위기를 더해준다. 제기 그릇의 뚜껑을 덮는 철변두(撤籩豆) 절차에서는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찬양하는 가사를 고려가요 〈서경별곡〉 선율에 얹어 부른 〈정동방곡〉을 연주한다.

여수 전라좌수영 둑제 재현행사 (https://www.youtube.com/watch?v=GXDi7yohbXY&t=1s)
동묘와 관왕묘제례악
중국은 당나라 시대부터 문묘(文廟)에는 공자를, 무묘(武廟)에는 주나라 건국에 큰 공을 세운 강태공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왔다. 이러한 전통은 송나라를 거쳐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이어졌으나,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가 큰 인기를 끌면서부터 관우를 모시는 관왕묘가 점차 무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한편 조선에서도 건국 초기에 무묘 건립이 논의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했으며, 둑제가 무인들의 제사인 무묘제례를 대신하였다.
1592년, 일본은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조선을 길목으로 내어줄 것을 요구하며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이에 명나라는 조선에 군대를 파병하여 전쟁이 본국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막고자 했다. 관우의 신봉자였던 명나라 장수 진린은 싸움터에 관우가 나타나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퍼뜨려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진린은 관우의 신묘한 도움 덕분에 전투에서 생긴 상처도 치유되고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며 남산 기슭에 남관왕묘를 세웠다. 또한 그는 관우의 생일에 지내는 제사에 조선 임금이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했으며, 선조는 마지못해 이를 따랐다고 한다.
전쟁 후 명나라 황제 신종은 '현령소덕관공지묘(顯靈昭德關公之廟)라는 현판과 자금을 보내와 관왕묘를 짓게 하였다. 이에 선조는 동대문 밖에 또 하나의 관왕묘인 동묘를 지었고, 광해군대에는 둑제의 제례에 따라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그러다 병자호란 때 청 태종 홍타이지가 처소로 사용한 후로는 청나라 사신들이 들리는 일종의 순례지 처럼 관광지로만 쓰인다.

동묘 현성전
숙종대에는 다시 관왕묘에 친히 배례를 하게 되는데 이는 충의의 상징인 관우를 신하들이 본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왕권 강화를 위해 관왕묘 제례를 활용한 이러한 의도는 영조와 정조로 이어졌다. 정조는 둑제에는 악무가 있으나 관왕묘 제례에는 악무가 없음을 지적하고, 〈관묘악장〉을 직접 지어 제례악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이 제례를 문묘제례와 같은 길례 중 중사로 격상시켜 왕권강화의 의지를 명확히 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관왕묘제례악〉은 《속악원보》에 실려있는데, 정대업(종묘재례악 중 무무(武舞)를 출 때 연주하는 음악) 11곡 중 태평소가 연주되어 고취악의 분위기가 풍기는 <소무>·<분웅>·<영관> 3곡을 채택하여 군악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조선 말기, 임오군란 이후 민비는 자신이 의지하던 무당 진령군(眞靈君)을 위해 북묘를 지어주었고, 고종의 후궁 엄비의 총애를 받아 국정을 좌지우지했던 무당 현령군(賢靈君)을 위해 서묘를 지어주어 동서남북 네 군데에 관왕의 사당이 존재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동묘만 남게 되었다.
마지막에 만들어진 서묘(숭의묘)는 관우뿐만 아니라 유비, 장비도 함께 모셔졌는데, 대한제국의 황제가 관우에게 배례하는 모양새가 예악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유비를 주향으로 세워 격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대한예전》에는 새로운 악장과 일무(佾舞)까지 기록돼 있어, 황제국의 격식을 갖추어 망국의 위기를 극복하려 애썼던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다.
조선시대 문신들의 제례 의식인 석전대제와 그 음악인 문묘제례악은 전승되어 보전되고 있다. 하지만, 무신들의 제례 의식은 무묘가 성립되지 못한 채 둑제와 관왕묘제로 행해졌으나, 현재는 그 모습이 잊혀져 있다. 다행히 여수에서 둑제를 재현하며 전통을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은 참으로 고무적이다. 그러나 동묘에서는 관왕묘제례악이 연주된 기억은 사라지고, 건물과 유물만이 세월 속에 닳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조선시대 무인들의 제례였던 둑제와 관왕묘제례가 그 예악인 제례악과 더불어 우리 곁을 지키는 무형유산으로 가치있게 재창조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은서(한성여중 교사, 국악박사)
<참고자료>
이재숙 외, 『조선조 궁중의례와 음악』,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 『朝鮮時代 通信使 行列 :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조선토힌사 문화사업회, 2022.
심승구. 「조선시대 둑제의 변천과 의례」, 『공연문화연구』 28집, 2014, 153~203쪽.
심승구. 「관왕묘 의례의 재현과 공연예술화 방안」, 『공연문화연구』 24집, 2012, 265~307쪽.
정은영. 「조선후기 통신사의 관왕묘 방문과 그 의미」, 『국제어문』 50집, 2010, 63~91쪽.
김주연. 「충무공 이순신장군 둑제의 공연콘텐츠 기획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