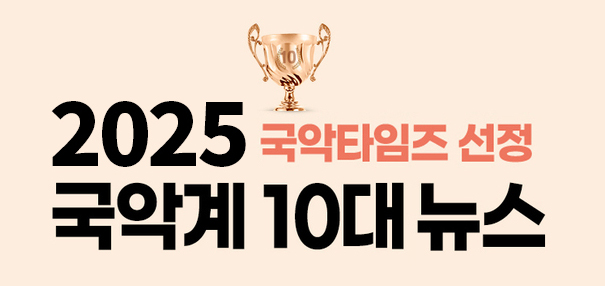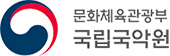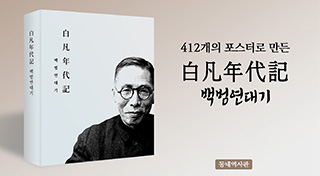용인민속촌의 북청사자놀음 공개행사
액운을 쫓는 사자의 몸짓, 복을 부르는 퉁소 소리
함경남도 북청 지방을 대표하는 탈놀이로는 북청사자놀음이 있다. 6.25 전쟁을 피해 월남한 예인들에 의해 남쪽으로 전승된 이 무형유산을 직접 보기 위해 나는 용인 민속촌을 찾았다. 굳이 말하자면, 이 공연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본래의 무대인 함경남도 북청으로 가야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없거니와, 본고장에서 북청사자놀음이 보존되고 있을 가능성도 희박함을 우리는 짐작으로 알고 있다. 공연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야외마당 객석은 인파로 가득 차 있었다.
민속촌 입구에서부터 공연장까지 풍물패가 풍악을 울리며 공연의 시작을 알렸고, 이어 공연장 마당에서는 함경남도 도지사의 인사말과 함께 북청사자놀음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북한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의미로 지방자치단체인 이북5도위원회를 조직하여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황해도에 도지사를 임명하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에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동물인 사자가 어떻게 우리 문화 속에 자리 잡게 되었을까? 그 기원이 궁금해졌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자의 포효'
한반도에는 사자가 서식하지 않는다. 사자는 주로 아프리카와 인도 등지에서 서식하는 동물로, 우리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존재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낯선 동물이 어떻게 탈놀이의 주요 캐릭터로 자리 잡았을까? 이는 인도의 불교가 한반도로 전해질 때, 사자에 대한 이미지도 함께 전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자의 포효(獅子吼)’에 비유하며, 사자를 당당하고 우직하며 두려움을 모르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사자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발견된다. 지증왕 13년(512) 6월, 이사부(異斯夫) 장군이 우산국(현 울릉도)을 정벌할 당시, 목우사자(木偶師子) 즉, 나무로 만든 사자를 배에 싣고 가 우산국 주민들을 위협하여 항복을 받아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는 사자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두려움과 권위를 상징하는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삼국사기』에는 가야 가실왕(嘉悉王)의 지시에 따라 우륵이 제작한 12곡의 가야금 곡에도 사자에 대한 기록이 있다. 12곡 가운데 열 곡은 지명을 반영한 것이나, ‘보기(寶伎)’와 ‘사자기(獅子伎)’는 다소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만약 12곡이 12가야 연맹체를 의미하는 노래였다고 가정했을때, ‘보기’와 ‘사자기’는 특정 가야연맹 지역에서 연행된 기예(技藝)였을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사자춤은 가야 불교의 성립과 더불어 연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때 함께 연주된 음악이 가야금 곡 ‘사자기’로 작곡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자춤을 춘 것에 대해서 기록한 가장 오랜 기록은 『삼국사기』 악지 중 최치원이 지은 「향악잡영(鄕樂雜詠) 5수」이다. 이 한시는 금환(金丸), 월전(月顚), 대면(大面), 속독(束毒), 산예(狻猊)를 읊고 있는데, 이 가운데 산예가 바로 사자춤이다.
遠涉流沙萬里來 (먼 사막을 건너 만 리를 와서)
毛衣破盡著塵埃 (털옷은 다 해어지고 먼지를 뒤집어썼네)
搖頭掉尾馴仁德 (머리를 흔들고 꼬리를 치며 어진 덕에 길들여지니)
雄氣寧同百獸才 (그 용맹한 기세가 어찌 온갖 짐승과 같으랴)
고려시대의 사자춤에 대한 기록은 이색(李穡)이 지은 『목은집(牧隱集)』에 실린 「구나행(驅儺行)」이라는 한시의 백택(白澤)이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는데 백택은 사자의 별칭이다. 그 한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나의식(驅儺儀式)은 음력 섣달그믐날 밤 악귀를 쫓고 새해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행해졌던 전통 의식인데 시를 보면 그 다양한 놀이의 모습을 생생히 떠올릴 수 있다.
舞五方鬼踊白澤 (오방귀와 사자춤을 덩실덩실 추고)
吐出回祿呑靑萍 (불 토해 내기, 칼 삼키기의 묘기를 펼치네)
글로 사자춤을 추며 잔치를 연 선비의 풍류
조선시대의 사자춤에 대한 기록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성종(成宗) 19년(1488년) 3월, 명나라 사신 동월(董越)이 조선을 방문하였다. 이때 조선에서는 그를 환영하기 위해 산대희(山臺戱)를 비롯한 다양한 연희를 선보였으며, 동월은 조선의 환대와 예술적 전통에 깊은 감명을 받아 「조선부(朝鮮賦)」라는 글을 지었다. 이 글에는 불을 토하는 묘기, 무동(舞童), 땅재주, 솟대타기 등 다양한 산악백희(散樂百戲)가 묘사되어 있으며, 특히 광화문에서 펼쳐진 공연 중 말가죽을 뒤집어쓰고 사자와 코끼리 춤을 추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유득공의 『경도잡지(京都雜誌)』에도 나례(儺禮) 의식을 주관하던 임시 관청인 나례도감(儺禮都監)에도 포장을 치고 무대를 만들어 연희하는 산희(山戲)에 사자가 등장하여 춤추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송만재가 지은 『관우희(觀優戱)』라는 시에도 사자춤이 소개되어 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자식이 과거에 급제하면 문연(文宴)을 열어 잔치를 베푸는 것이 관례였으나, 가난한 형편으로 이를 할 수 없었던 송만재는 잔치 대신 아들의 급제를 축하하는 시(詩) 『관우희』를 지어 그 기쁨을 표현했다. 청빈한 삶을 지향하던 조선 선비의 멋과 품격이 느껴지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이 작품에는 줄타기, 불 토하기, 처용무(處容舞), 사자춤 등의 다양한 공연이 묘사되어 있다.

김홍도의 평안감사향연도 중 연광정 부분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김홍도가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평안감사향연도(平安監司饗宴圖)’에서도 사자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 그림은 평안감사가 평양에서 베푼 성대한 연회를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으며, 연광정(練光亭)에서 펼쳐진 잔치 장면 속에 청색 사자와 황색 사자가 역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사자춤 이외에도, 흥겹게 춤추는 무희와 녹초삼을 입은 집박 악사의 모습이 보이며, 붉은 도포를 입고 앉아 해금, 대금, 피리, 장구, 좌고 등 삼현육각 편성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악공들의 모습도 생생하게 담겨 있다. 마당에는 청학과 황학, 연꽃, 배 모형 등이 준비되어 있어, 학연화대합설무(鶴蓮花臺合設舞)와 선유락(船遊樂) 등의 공연이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생동감 넘치는 잔치 모습을 담은 ‘평안감사향연도’는 당시 음악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고증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친숙한 호랑이를 두고 왜 사자?
한반도를 대표하는 맹수는 단연 호랑이이다. 우리 민족은 호랑이를 단순한 맹수가 아니라, 친숙하고 신성한 수호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왔다.
임진왜란 당시, 호랑이가 왜적을 물리쳐 주었다는 설화가 『임진록』에 전해지기까지 했다. 부정한 관리나 악행을 저지른 자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는 기록이 『고려사』 및 『조선왕조실록』에 여러 차례 등장하기도 한다.
민간설화에서는 불효한 자, 욕심 많은 부자, 백성을 괴롭히던 탐관오리를 벌하거나 잡아가는 존재로 등장하는 한편, 효자나 착한 사람을 도와주는 존재로도 묘사되었다. 민화(民畵)에서는 까치와 호랑이가 함께 그려져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정의롭고 익살스러운 존재로 묘사되며, 무속신앙에서는 산신(山神)의 신하로 등장시키기도 한다.
1988년 서울올림픽 마스코트도 호돌이이며, 한반도의 모습이 대륙을 향해 포효하는 호랑이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친숙하고, 사악한 것을 물리치며 경사스러운 일을 맞이하는 상징적 존재인 호랑이를 두고, 왜 ‘벽사진경(辟邪進慶)’의 상징으로는 사자가 사용되었을까?
호랑이는 역시 호랑이
호랑이는 역시 호랑이였다.
옛 우리 속담에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과거 호랑이에 물려 죽거나, 마마(천연두)로 사망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가 가장 두려운 재난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준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수많은 호랑이 피해 기록이 남아 있다. 태종 2년(1402)에는 겨울에서 봄까지 경상도에서 호랑이에 사망한 자가 수백 명에 이르렀고 밤에 경복궁 근정전 뜰까지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고, 숙종 27년(1701년) 6~7년간 강원도에서 호랑이에게 물린 사람이 300여 명에 달한다는 기록이 있으며, 영조 10년(1734년) 전국에서 호환으로 죽은 사람이 140명에 달한 기록이 있다. 또, 영조 30년(1754년) 경기도에서만 한 달 동안 120여 명이 호랑이에게 희생되었다고 전해진다. 사람의 피해가 이 정도일진데 소, 말, 돼지 등 가축의 피해는 또 얼마나 컸겠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호랑이 탈을 쓰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악귀를 쫓는 놀이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혹한 일일 수 있었겠다는 생각에 다다랐다. 호랑이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가축을 잃은 사람들 앞에서, 부모, 형제, 자녀를 잃은 이웃들 앞에서 호랑이 탈을 쓰고 유쾌한 춤을 춘다는 것은 가혹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보다는 현실의 삶에서 마주할 일이 없는 맹수인 사자가 등장하는 것이 놀이로 승화할 만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북청호랑이놀음’보다는 ‘북청사자놀음’이 마을공동체 놀이로 더 적절하였을 것이다.
오랜 세월 이렇게나 많았던 호랑이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호랑이 가죽을 장식품이자 전리품으로 삼고자 한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사냥당하며 결국 우리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행운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지만, 한때 가축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던 호랑이, 표범, 늑대, 곰 등 한반도의 맹수들은 모두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북청사자놀음
북청사자놀음은 벽사진경(辟邪進慶)의 의미를 담아 함경도 각 고을에서 마을 공동체가 함께 어울리며 펼치던 잔치마당이었다. 남쪽 지방에서 정월대보름에 풍물패가 행하는 ‘지신밟기’와 유사한 놀이이다. 사자가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집안 구석구석의 잡귀를 쫓는 나례(儺禮) 의식을 펼친다. 함경남도에서 원래 행해졌던 모습을 알 수는 없으나 현지에서 거주하다 월남한 예인들의 구술에 따르면 마을마다 사자의 모양이 조금씩 달랐으나 한 마리의 사자를 시위(侍衛)하여 퉁소, 피리, 태평소, 꽹과리 징, 북, 소고 등의 악대가 반주하며 마을 곳곳을 다니며 흥겨운 마당을 만들었다.
북청사자놀음 반주에는 퉁소(혹은 퉁애)라는 악기가 등장한다. 대금 정도 크기의 악기를 세로로 부는데 과거에는 이처럼 세로로 부는 악기를 ‘종적(縱笛)’이라고 불렀다. 퉁소는 이 종적에 유래한 악기로 보고 있다. 백제금동대향로의 주악상(奏樂象), 신라 토우의 모습에서도 종적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퉁소는 삼국시대의 종적이 개량된 것이라기보다는 당나라에서 서역의 종적을 개량한 악기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금처럼 갈대청을 붙여서 취구로 바람을 넣으면 부드럽고 은은하게 청(淸)이 떨리며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연주하는 모습도 독특하고 재미있다. 퉁소 소리에 어우러지는 함경도 사자춤을 한번 감상해 보자.

함경도 사자놀이 (https://www.youtube.com/watch?v=bFqL-k0jQH8&t=276s)
현재 연행되는 북청사자놀음 나례의 의미보다는 공연 작품으로서 볼거리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북청사자놀음에서는 단연 사자춤이 압권이라 할 수 있다. 사자의 털은 동·서·남·북·중앙을 상징하는 청·백·적·흑·황의 오방색으로 꾸며져 있으며, 입을 열고 닫으며 딱딱 소리를 내거나, 익살스럽게 혓바닥을 내밀고 움직일 수도 있다. 춤은 하늘로 치솟고 좌우로 뛰기도 하고 고개가 크게 움직일 때마다 사자의 갈기가 바람을 가르며 역동적으로 흔들려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보존회에서 재현하는 ‘북청사자놀음’은 크게 마당놀이와 사자춤의 두 마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당놀이 마당은 애원성춤, 사당·거사춤, 무동춤, 넋두리춤, 곱추춤, 칼춤 등 볼거리가 연행된다. 본래 북청사자놀음에 있었다기보다는 사라져가는 함경도지방의 춤을 재현하는 의미가 짙다.

북청사자놀음의 사자춤
사자놀이 마당은 초장·중장·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장은 두 마리의 사자가 등장하여 기교 없이 가볍게 몸 푸는 장면이 펼쳐진다. 중장으로 접어들면 사자는 엎드리고, 기고, 뛰고, 입 맞추고, 몸을 털고, 머리를 좌우로 돌려 이를 잡고, 꼬리 흔들며 몸을 긁는 등 온갖 다양한 기교를 선보인다. 그러다 마당 가운데 있는 토끼(혹은 어린아이)를 발견하여 혀로 핥는 등 탐을 내다 급기야 먹고는 탈이 나 쓰러진다. 그러면 사자를 소생시키기 위해 양반이 축문을 읽기도 하고, 대사가 들어와 염불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도 효험이 없자 의원이 들어와 침을 놓고 감로수를 먹여 소생시킨다. 말장에 사자가 소생을 하면 사당, 거사 등이 들어와 소고춤을 추고, 아이를 사자에 태우면 무병장수한다는 속설에 따라 아이를 사자 등에 태우기도 하며 대동 마당이 펼쳐지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현존하는 탈놀이 중 사자가 등장하는 공연으로는 북청사자놀음 이외에도 봉산탈춤, 강령탈춤, 은율탈춤, 수영야류, 통영오광대(사진출처 : 국립국악원 국악사전 '사자춤') 등이 있다. 이제 이들 탈놀이에서 사용되는 사자탈의 차이를 비교하며 칼럼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봉산탈춤 강령탈춤 은율탈춤

수영야류 통영오광대
봉산탈춤과 강령탈춤의 사자탈은 눈알이 매달려 있어 움직임에 따라 대롱대롱 흔들리는 특징을 가진다. 은율탈춤의 사자탈은 대나무 소쿠리로 만들어져 얼굴이 다소 입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북청, 봉산, 강령, 은율의 사자는 몸의 털이 갈기처럼 표현되어 있으며, 생동감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다.
수영야류에서는 사자가 호랑이를 잡아먹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요소이다. 또한, 사자의 몸통은 삼베로 만들어지며, 세 명이 탈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거대한 사자가 등장한다. 통영오광대의 사자는 길죽한 대나무 소쿠리로 만들어진 사자탈을 사용하며, 몸채는 땅에 끌리는 긴 포대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자료>
전경욱,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화산문화, 2001.
전경욱, 『한국의 가면』, 설화당, 2007.
엔도키미오,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이담, 2009.
최준식·송혜나, 『국악, 그림에 스며들다』, 한울, 2018.
국립국악원 국악사전 ‘사자춤’(https://www.gugak.go.kr/ency/topic/view/1113)
우리역사넷 호환의 발생과 추이(https://link24.kr/880iXfI)